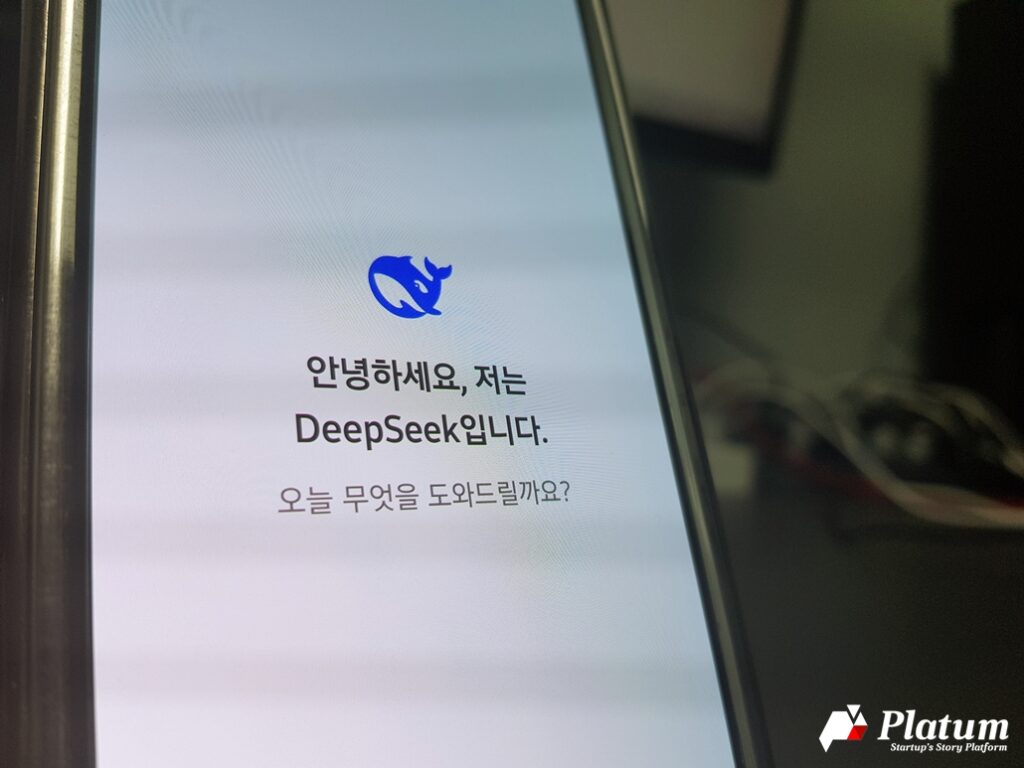
딥시크, API 서비스 비용과 수익 공개…”최대 545%의 이론적 이익률 가능”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사 API 서비스의 비용과 수익 구조를 처음으로 공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딥시크는 지난 1일 중국판 네이버 지식인인 즈후(知乎)를 통해 핵심 비용 절감 기술과 함께 최대 545%에 달하는 이론적 이익률을 공개했다.
지난 1월 추론 특화 모델 ‘R1’로 화제를 모았던 딥시크는 2월 24일부터 시작된 ‘오픈소스 위크’ 기간 동안 5개의 오픈소스 결과물을 공개한 데 이어, 5번째 공개 이후 6일째 되는 날 ‘딥시크-V3/R1 추론 시스템 개요’ 기술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모델 추론 시스템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 세부 사항이 담겨 있어 업계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딥시크의 추론 시스템은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 시간을 목표로 최적화되었으며, 특히 대규모 다중 노드 전문가 병렬(Expert Parallelism, EP) 방식을 적용했다. 이 방식은 AI 모델을 여러 개의 작은 “전문가”로 나누고, 각 전문가를 개별 GPU에서 실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 운영 방식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딥시크의 V3 시스템에서는 한 층(layer)마다 256명의 전문가가 존재하지만, 매번 8명만이 활성화되며, 이를 동적으로 할당함으로써 계산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전체 모델의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성능은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술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 아키텍처는 특히 대규모 모델 운영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GPU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딥시크가 비용 효율적으로 고성능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 딥시크는 하루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API 서비스의 수익성을 공개했다. 중국 시간 기준 2월 27일 정오부터 2월 28일 정오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GPU 임대 비용을 시간당 2달러(약 2,912원)로 가정했을 때 하루 총 비용은 8만 7천 달러(약 1억 2,668만원), API 서비스의 이론적 총수익은 56만 2,027달러(약 8억 1,842만원)로, 이익률은 54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 딥시크는 하루에 47만 5,955달러(약 6억 9,308만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수치는 AI 모델 서비스 시장에서 매우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가 AI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수익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DeepSeek-V3의 가격이 R1보다 저렴하고,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이 무료로 제공되며, 일부 서비스만 수익을 창출하고, 비혼잡 시간대에는 야간 할인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이다.
딥시크 측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기반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문서 공개로 예상치 못한 논쟁도 불거졌다. 딥시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MaaS(모델 서비스, Model-as-a-Service) 공급업체인 루천테크(潞晨科技)와 실리콘 플로우(SiliconFlow, 硅基流动) 간의 공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춘절 연휴 기간 딥시크가 서비스 과부하를 겪었을 때, 두 회사를 포함한 여러 AI 인프라 업체들이 사용자들에게 딥시크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루천테크 창업자 요우양(尤洋)은 이전에 “MaaS 모델에서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손실이 커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딥시크의 높은 이익률 공개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요우양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실리콘 플로우 창업자 위엔진훼이(袁进辉)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결국 과거 루천테크의 표절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AI 업계 관계자들이 속속 논쟁에 참여하는 사태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번 딥시크의 기술 및 수익성 데이터 공개는 중국 AI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대형 언어 모델 서비스의 운영 비용과 수익성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계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모델 재평가의 움직임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이러한 데이터 공개가 중국 AI 기업들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중국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알리바바,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매출 8% 증가, 영업이익 83% 급증
중국 전자상거래 공룡 알리바바(Alibaba, 阿里巴巴)가 2025 회계연도 3분기(2024년 4분기) 실적을 2월 20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한 2,801억 5,400만 위안(약 56조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무형자산 손실 비용 감소와 조정후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A)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3% 급증한 412억 500만 위안(약 8조 2,595억원)을 달성했다.
조정된 EBITA는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한 548억 5,300만 위안(약 10조원)으로 매출 증가와 운영 효율성 개선에 따른 것이나, 이커머스 사업 투자 확대로 상승폭이 일부 제한됐다.
이번 분기 주주 귀속 순이익은 489억 4,500만 위안(약 9조 8,110억원)에 달했으며, 순이익은 영업이익 증가, 보유 지분 투자 평가 이익 증가, 지분법 평가 투자 손익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33% 급증한 464억 3,400만 위안(약 9조 3,076억원)을 기록했다. 비일반회계기준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한 510억 6,600만 위안(약 10조원)이다.
타오티엔(淘天集团) 그룹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한 1,360억 9,100만 위안(약 27조원)을 기록했다. 그중 타오티엔 그룹의 중국 내 리테일 커머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한 1,295억 1,600만 위안(약 25조원), 도매 부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65억 7,500만 위안(약 1조 3,175억원)을 달성했다.
리테일 커머스 매출은 온라인 GMV(총 거래액) 증가 및 수수료율 상승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고객 관리 수익(CMR)이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1,007억 9천만 위안(약 2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직영 및 기타 매출은 티몰 슈퍼마켓, 티몰 글로벌 및 기타 직영 사업 축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9% 감소한 287억 2,600만 위안(약 5조 7,552억원)에 그쳤다.
타오티엔 그룹은 2023년 11월 장판(蒋凡)이 타오바오(Taobao, 淘宝)로 복귀하면서 저가 경쟁 전략을 포기했으며, 2024년 2월에는 신규 입점판매자에게 최대 250만 위안(약 5억 87만원)의 운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란싱 플랜(蓝星计划) 2025’를 발표했다.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그룹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377억 5,600만 위안(약 7조 5,651억원)으로, 그중 국제 리테일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315억 5,300만 위안(약 6조 3,222억원), 국제 도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62억 300만 위안(약 1조 2,428억원)이다.
그러나 유럽 및 중동시장 투자 확대에 따른 적자 심화로 조정후 감가상각 전 영업손실은 49억 5,200만 위안(약 9,921억원)에 달했다.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317억 4,200만 위안(약 6조3,598억원)을 기록했다. 퍼블릭 클라우드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으며, AI 관련 제품 매출은 6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조정후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31억 3,800만 위안(약 6,287억원)에 달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2023년 8월 자체 개발한 대규모 AI 모델 ‘Qwen’을 첫 공개했으며, 2025년 1월에는 ‘Qwen2.5-VL’ 및 ‘Qwen2.5-Max’ 오픈소스를 공개했다. Qwen 시리즈는 허깅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모델과 경쟁하고 있다.
현재 허깅페이스에서 Qwen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파생 모델이 10만 개를 돌파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AI 모델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측은 전했다.
차이냐오(菜鸟) 그룹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 감소한 282억 4,100만 위안(약 5조 6,583억원)으로, 조정후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6% 급감한 2억 3,500만 위안(약 470억원)이다.
차이냐오의 수익성 급락에 대해 알리바바 측은 “물류 네트워크에서 출발한 차이냐오가 물류기업으로 포지셔닝 중이고,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솔루션과 중국 내 물류 서비스의 수익성 하락 때문”이라며 “국내외 물류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알리바바가 물류 사업의 운영 효율과 수익성을 더욱 최적화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차이냐오는 글로벌 물류 확장을 핵심전략으로 삼아, 1월 초에는 중소 상인들이 현지화된 국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개의 크로스보더 가맹점 센터를 오픈했다. 또한 1월 중순에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마이애미, 시카고에 위치한 대규모 물류 센터에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여 택배 주문 처리 효율을 개선했다.
생활서비스 그룹의 매출은 외식배달 서비스 어러머(饿了么)와 지도 서비스 까오더(高德)의 거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169억 8,800만 위안(약 3조 4,037억원)을 기록했으며, 조정후 감가상각 전 영업손실은 5억 9,600만 위안(약 1,1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대폭 개선됐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매출은 동영상 플랫폼 요쿠(优酷)의 광고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한 54억 3,800만 위안(약 1조 895억원)을 기록했으며, 조정후 감가상각 전 영업손실은 3억 900만 위안(약 6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크게 개선됐다.
이번 분기 알리바바는 최대 123억 홍콩달러(약 2조 3,041억원)에 선아트리테일(Sun Art Retail, 高鑫零售)의 지분 전량을 매각했으며, 약 74억 위안(약 1조 4,822억원)에 인타임백화점(Intime Department Store, 银泰百货)의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또한 이번 분기에는 총 1억 1,900만 주의 보통주를 총 13억 달러(약 1조 8,930억원)에 매입했다. 이사회가 승인한 207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따라 2027년 3월까지 추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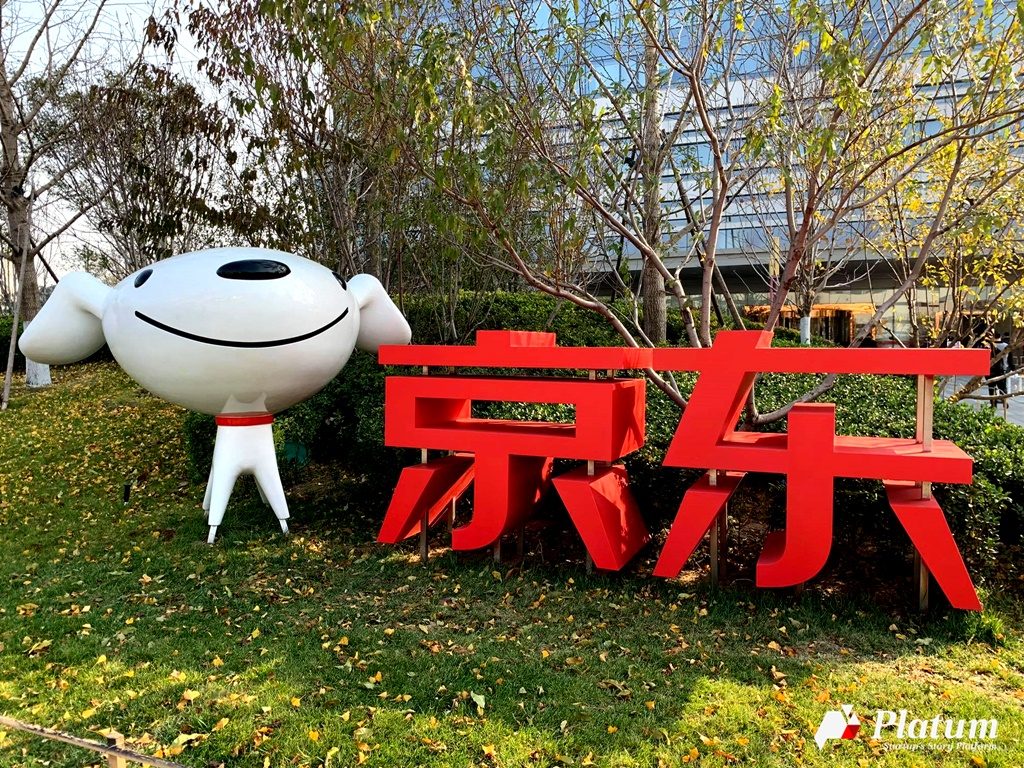
징둥, 외식배달 시장 본격 진출…입점 업체 수수료 면제·배달원 복지 강화
중국 이커머스 공룡 징둥(JD.com, 京东)이 새해 초 공식적으로 외식배달 서비스에 진출했다. 징둥은 5월 1일 이전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연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외식 배달 수수료는 약 6-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징둥은 배달원들에게 5대 보험(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과 장기주택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배달원이 부담해야 할 개인 부담금까지 회사가 대신 지원하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내놓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징둥의 주요 배송 파트너는 현재 약 130만 명의 라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다다(达达)다. 징둥의 정규 택배원들이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과 달리, 다다의 배달원들은 대부분 플랫폼과 유연한 계약 형태로 협력하는 크라우드소싱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징둥은 2022년에 외식배달 사업의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당시 징둥은 로컬라이프 서비스 시장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배달 가맹점들이 징둥따오자(京东到家)에 입점하고 배달은 다다가 담당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출시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외식배달 사업의 대표기업 메이투안(美团)의 즉시배송 서비스 ‘산꼬우(闪购)’가 징둥의 주력 분야인 디지털 가전 분야에서 급성장하자, 징둥은 징둥따오자와 징둥샤오스다(京东小时达)를 통합한 ‘징둥먀오쏭(京东秒送)’을 출시했다.
징둥 앱의 메인 페이지에 최단 9분 내 배송을 표방하는 ‘먀오쏭 전용’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으며, 커피 및 밀크티 배달 중심으로 외식 배달 서비스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징둥은 ‘프리미엄 배달’ 카테고리를 추가하며 본격적으로 외식배달 시장에 진출했다.
징둥의 외식배달 진출은 경쟁사에 대한 반격이자 즉시배송 시장에서의 중요한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즉시배송 시장은 연간 1조 위안(약 200조원) 규모이며 매년 5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젊은 사용자의 비중이 높고 구매력이 강한 시장이기도 하다.
이 시장에서 징둥, 핀둬둬(拼多多)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이투안, 어러머(饿了么) 등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갖춘 배달 플랫폼, 도우인(抖音, 글로벌 서비스명: TikTok) 등 온라인 트래픽을 보유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등이 차세대 성장 기회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타트업 탐방] 오후 5시, 자리는 비었지만 일은 계속되는 회사… 하이퍼커넥트 DSCF6818](https://platum.kr/wp-content/uploads/2025/11/DSCF6818-150x150.jpg)
![[BLT칼럼] 엔젤투자의 3가지 즐거움 1114b3aee2b12](https://platum.kr/wp-content/uploads/2025/11/1114b3aee2b12-150x150.png)
![[중국 비즈니스 트렌드&동향] 스타벅스 중국 사업 지분 60% 매각 20230510_133701](https://platum.kr/wp-content/uploads/2025/11/20230510_133701-150x150.jp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