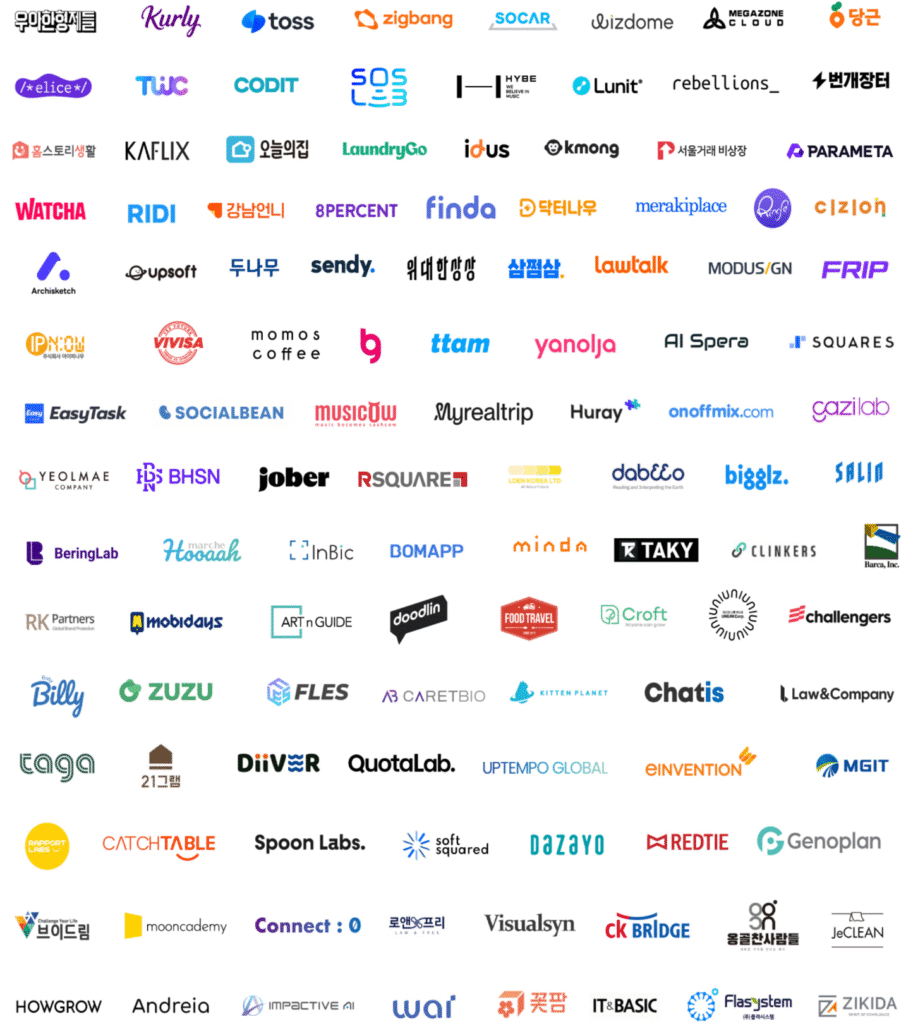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정책제안서의 제목은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Scale-up Korea’였다. 야심찬 제목이지만, 2,500여 개 스타트업의 현실적 고민과 생존 전략이 담긴 절박함이기도 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졌을까. 이제 스타트업은 단순한 신생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정책제안서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스타트업의 성장이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제안서에는 세 개의 큰 방향과 아홉 개의 구체적 과제가 담겨 있었다. 각각의 과제는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첫 번째 방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비즈니스모델 다각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다.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후테크,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신산업이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제안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를 통해 각 기금의 최대 10%를 스타트업 투자에 배정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이었다.
‘AI 기술과 글로벌 인재로 다시 설계하는 미래’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AI·소프트웨어 분야의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세제 혜택, 스톡옵션 제도 개선,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 인재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과 엑싯 인프라 구축’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완성을 위한 조건이다. 창업과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엑싯(Exit)’이다. M&A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완결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방향은 ‘혁신 인프라로 국가 리디자인’이다. 이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야심찬 제안이다.
‘GovTech로 여는 공공혁신’은 전 세계적으로 8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거브테크 산업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정책 집행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스타트업이 공공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이 제안은, 국가와 스타트업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정부는 더 이상 규제자가 아닌 혁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공공데이터, AI 신산업의 원천이 되다’는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AI 산업 발전의 토대로 삼자는 제안이다. 흥미로운 발상의 전환이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 스타트업에 답이 있다’는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인구소멸, 소상공인 지원 등 복잡한 사회문제에 스타트업의 창의적 해법을 접목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스타트업을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사회 혁신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
세 번째 방향은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리빌딩’으로, 제도 자체를 스타트업 친화적으로 재설계하자는 내용이다.
‘규제샌드박스 2.0. 실증을 넘어 제도로’는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증→정책→제도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안한다. 특히 ‘100일 내 해소’를 목표로 하는 규제 패스트트랙은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 도구가 될 것이다.
‘제도의 사용자, 스타트업이 설계에 참여한다’는 제도의 수혜자가 제도의 설계자로 참여하는 혁신적 접근법이다. 국회와의 연결 브릿지 조직 설립, 정책 커뮤니티 내 규제 해결 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정보도 전략이다. 더 쉽게! 더 빠르게!’는 복잡한 규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자연어 검색, 산업·서비스별 키워드 중심 탐색 기능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규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이 제안서를 읽다 보면, 스타트업이 더 이상 국가 경제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에 자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밀한 규제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2016년에 설립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현재 2,530여 개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다. 토스, 쿠팡, 당근마켓, 직방, 소카, 위즈돔 등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서비스들의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는 말뿐인 창업국가가 아닌, ‘진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실천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 제안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지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가는 여정에서 스타트업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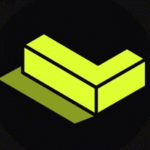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