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과 패럴림픽 종목을 보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바로 게임룰이다.
통상적으로 축구,배구, 체조, 수영 등등 아주 오랬동안 전세계 사람들이 게임룰을 잘 알고 있고 즐기고 있는 스포츠들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어 경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부 종목은 남성과 여성 또는 몸무게로 나누어 경기를 치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핸디캡이 없는 비 장애인(특히 오감과 신체 및 지능에 문제가 없는)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패럴림픽에서는 다르다. 한 가지 이상의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에 맞게 게임룰이 조정되어 있다. 휠체어 펜싱처럼 기존 일반 펜싱 규칙에 휠체어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룰을 적용시켜 경기를 하기도 하고 골볼(Goalball)처럼 아주 새로운 게임룰을 만들어 게임을 하기도 한다.
 휠체어 펜싱 Wheelchair Fencing (source : http://l2012.cm/P7eEQi)
휠체어 펜싱 Wheelchair Fencing (source : http://l2012.cm/P7eEQi)

골볼 Goalball (source : http://l2012.cm/P7eEQi)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기존 올림픽 종목이나 패럴림픽 종목이나 인간의 개별 능력에 맞도록 ‘상대적인 게임룰’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어느 쪽이 다수이고 많은 관심을 받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여성들끼리 또는 남성들끼리 나누어 경기를 하는 것이나 신체 일부에 장애를 가진 선수들끼리 경기를 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자 특성에 맞도록 게임룰을 정하면 공평하기 때문이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하면 공평하다고 동의할 수 있는가의 상대적인 룰’이지 결코 절대적인 룰이 아니다. 단지 몸무게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은 체급별로 나누어 경기를 치르고 대부분의 기록경기들은 몸무게와 상관없이 경기를 할 뿐이다.
그런데 만약 일반 펜싱경기나 수영경기에 체급별 경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권투나 레슬링처럼 70kg(예를 들어) 체급의 펜싱선수와 수영선수가 있는 것이다. 언뜻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체격의 공평성을 더욱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더 공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패럴올림픽 20개 종목들과 비교해 보면 그 경계가 상당히 애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를 것이다. 오히려 신체적 핸디캡이 기술적으로 극복이 되어 부분적으로 더욱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림픽과 패럴림픽이의 경계에 있는 다른 게임룰도 반드시 필요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의 기술적 진보의 세상은 아니더라도, 게임룰을 정교하게 디자인하여 게임을 통해 현재의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는 장애인과 비 장애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서비스는 없을까?
물론 어려운 주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 신체 장애 뿐만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은 장애 종류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소통해 본 경험 또한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교육을 게임처럼 하여 그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시도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비 장애인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나 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장애종류 (source : 서울교육대학교 권정민교수)
만약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장애 극복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 장애 그대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라면, 바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법 또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를 벗어나, 기술적으로 Brain Wave, Sound, Eye Tracking, Gesture, Voice Sencing, Face Recognition, Geospatical Sencing 등이 활용된 UI/UX 가 지금보다 더욱 발달하여 상용화가 된다면 바로 이러한 분야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술적 도움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식과 행동의 문제가 더 커 보인다. 단지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 또는 게임 포 체인지 Game for Change 분야에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돈이 안 돼서 그런 걸까?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 2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내 놓았을 때 그리 큰 시장도 아니고 새로운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수용 능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나 관련 단체들이 주축이 된 시장이다. 하지만 ‘장애인 일상과의 소통’의 관점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장애가구는 전체 가구의 12.3%로써 8가구 당 1가구가 장애인이 있는 가구이고 이들의 사회생활 반경으로 보면 더욱 커진다. 장애인들과의 소통에 초점을 둔 서비스라면 이는 단지 장애인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지금은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경계가 극명하게 구분되어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다)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패럴림픽처럼 이 경계는 게임룰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인식이 유연해 질 수 있다. 오히려 약간의 장애가 기술적으로 극복되어 평균이상의 능력을 갖게 되면 그 경계 기준이 완전 달라 질 수 있는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통한 혼합 현실(Mixed Reality)이 이를 상당히 앞당기고 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그들과의 소통 문제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게임 기법들을 잘 활용하여 다자인하면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면(gamification) 우리가 미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기회들이 바로 여기서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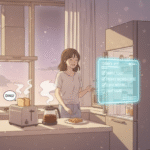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