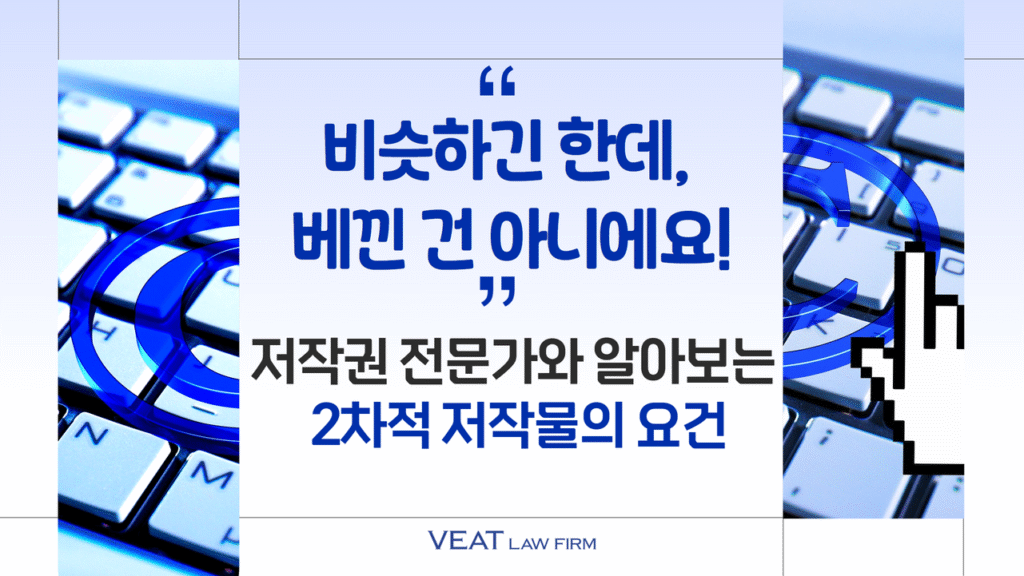
표절 시비가 붙은 작품에서 흔히 나오는 해명입니다. 원작과의 유사성이 의심되지만, 창작자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반면 원작자는 “내 아이디어를 가져다 썼다”고 반발합니다.
이럴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고’와 ‘침해’ 사이, 그 애매한 경계는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저작권법은 이처럼 기존 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2차적저작물’이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행위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엇이 문제일까?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A라는 작품과 B라는 작품 사이에서 표절 시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A에 대한 표절, 즉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B는 A에 기초(의거, 모방)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B가 A와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A에 기초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면, B는 A의 2차적저작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B에는 A에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A를 실질적으로 변형하여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원저작물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를 다소 변형하기는 하였지만, 그 변형의 정도가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는 아니라면 그것은 여전히 A의 복제물일 뿐, 2차적저작물은 아닙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 사이에는 여전히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A에 창작적 요소를 더했다고 해도, 변형이 지나쳐서 A와 B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면, 그때부터 B는 A의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A와 무관한 완전히 별개의 저작물이 됩니다.
2차적저작물은 창작자 간 협업, 콘텐츠 리믹스, 패러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등 현대 콘텐츠 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자칫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과 사업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저작권, 2차적저작물, 콘텐츠 계약 및 분쟁 대응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적저작물 성립 요건 검토, 원저작물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사전 계약 구조 설계 및 권리 귀속 검토, 저작권 표절 의혹 대응 전략 등에 대하여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2차적저작물을 비롯하여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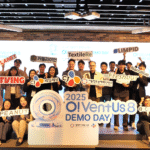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