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늦은 밤, 스타트업 대표가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으로 정관과 투자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팀원들 연봉은 다 결정했는데, 내 월급만 정하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그의 말에는 묘한 자조가 섞여 있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대표의 월급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이었다. 초기 스타트업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창업자들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는 문제 앞에서 항상 망설였다. 많이 가져가자니 회사 자금이 부담되고, 적게 가져가자니 생활이 불가능했다.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대표의 급여는 달라져야 한다. 투자를 받지 않은 초기에는 대표가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단에 무보수 신고를 해야 한다. 첫 투자금이 들어오면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시리즈 A 이후에는 시장 평균의 70-80% 수준, 시리즈 B 이후에는 시장 평균 정도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도 분명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대표의 연봉은 단순히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법과 세법이라는 두 개의 단단한 울타리가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의 총액 한도를 정하고, 이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
판교의 한 스타트업은 이 문제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정했다가 나중에 큰 곤란을 겪었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죠.” 이 회사의 재무담당자는 씁쓸하게 회상했다.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라면 투자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때로는 ‘임원 연봉을 15% 이상 인상할 때는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와 같은 조항이 숨어있기도 한다. 과세당국의 눈높이에 맞춰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보수 지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위별 보수의 한도를 정하며, 급여 기준표를 만들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문서화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동갑인 두 공동창업자의 연봉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났다. 한 명은 미혼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자녀가 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자의 생활 여건에 따라 ‘생존가능한 최저선’을 다르게 설정했다. 더 놀라운 것은 투자자들도 이를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어느 반도체 회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40대 중반의 두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둘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독신이었다. 이사회는 두 사람의 급여를 크게 차등을 두기로 결정했다. 누구도 이를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우리 사회는 리더의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가 가장 먼저 급여를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실제로 성수동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런 경험을 했다. “처음에는 월급을 전혀 안 받았어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6개월 만에 건강이 나빠졌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결국 회사에도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현재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이런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한 투자사 대표는 “과거에는 대표가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미덕으로 봤지만, 이제는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건강한 경영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연봉 책정에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있다. 회사 내 최고 연봉자와 최저 연봉자의 중간값을 구하고, 그 중간값과 최고값 사이에서 대표의 연봉을 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며, 투자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세전 급여 설정액에 따른 실제 수령액과 법인의 총 부담액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다. 회사의 재정 상황, 대표의 생활 여건, 직원들의 급여 수준, 투자자들의 기대,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스타트업 대표의 급여는 ‘희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과 구조를 세워두고, 회사의 성장에 따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밤이 깊어가는 공유 오피스에서, 그 결정의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대표는 엑셀 파일 옆에 놓인 정관과 투자계약서를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이제는 ‘얼마를 받을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 결정을 회사의 제도와 문화로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마도 이 문제의 진정한 해답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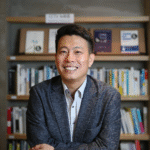

![[Startup’s Story #511] "교실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 어느 창업자의 DAY1 unnamed (1)](https://platum.kr/wp-content/uploads/2025/12/unnamed-1-10-150x150.jp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