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여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2025년부터 4가지 핵심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둘째, 그린 혁신리더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셋째, 글로벌 기후테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넷째, 기후테크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중기부는 탄소 무역규제 대응 등 수출 중소기업의 공정혁신과 자원순환 분야에서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지원과 6억원의 실증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대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K-테스트베드를 연계해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는다.
현장 대화에 참석한 수퍼빈 김정빈 대표는 AI 기반 로봇 ‘네프론’을 통해 버려진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선별·수거하는 사업을 소개하며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이 놀이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퍼빈을 비롯해 와이파워원(무선충전), 비엔지파트너스(녹색금융), 넷스파(재생 나일론), 파이퀀트(공기질·수질 분석), 마린이노베이션(해조류 바이오 제품), 케빈랩(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기후테크 기업들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기후테크 5대 분야(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별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하고, 테마별로 5개 이상의 기업을 육성해 28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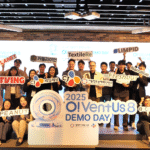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