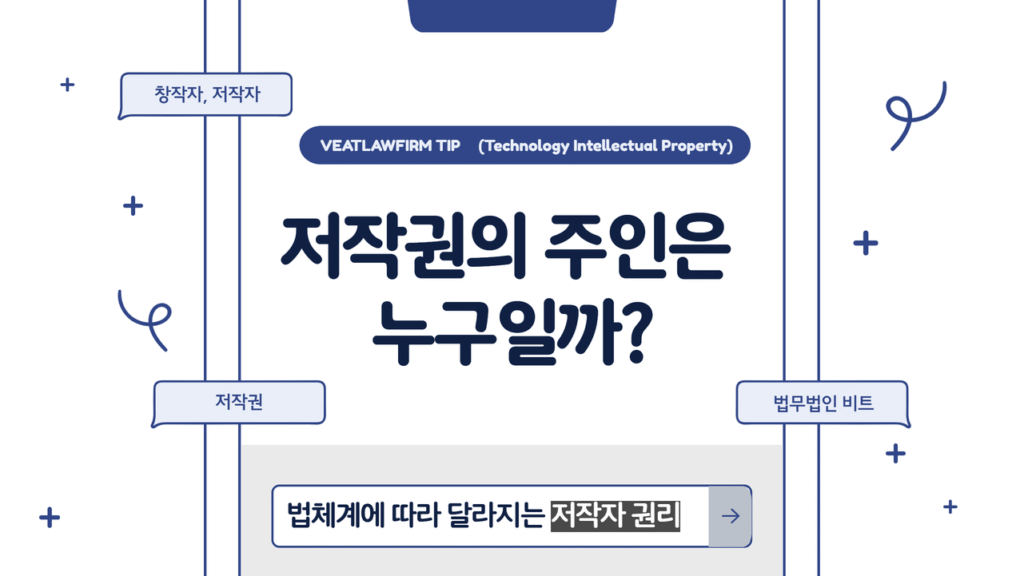
지난 글에서 저작자의 기본 개념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작자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는 저작자를 규정하는 관점에서부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저작권 제도의 성격을 달리 형성해 온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작자의 개념을 둘러싸고 각국의 입법례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와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륙법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저작자는 정신적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영미법계에서는 저작자는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창작을 기획한 제작자도 저작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큰 흐름은 저작권을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로 보는 대륙법계의 시각과, 저작권을 기본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copyright)로 보는 영미법계의 시각으로부터 기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륙법계에서는 물건을 만든 자에게 그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것처럼 저작권을 창작에 대하여 당연 부여되는 자연권적인 권리로 보는 데 비하여, 영미법계는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창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대가(對價)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륙법계에서는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중요시하는데 반해, 영미법계에서는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에서는 문자 그대로 저자(author), 즉 현실적으로 창작행위를 한 ’창작자(creator)를 저작자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서 저작자는 자연인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에 영미법계에서는 녹음물을 비롯한 각종 제작물 등 복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널리 저작권의 객체로 보며, 그에 따라 창작자라기보다는 저작물 이용자로서의 성격이 짙은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까지 저작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하는 제작자 등도 저작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를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되는 양대 조류는 각자의 뿌리 깊은 법문화에서 유래되는 것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조율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국제적으로 이와 같은 대립을 가급적 해소하고자 하는 통일화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인격권과 업무상저작물과 관련하여서 그러한 통일화의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미법계인 영국은 1988년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미국은 1990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시각적 미술저작물(works of visual arts)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는 규정(제106조의 A)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면서도 업무상저작물과 관련하여서는 영미법계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범위와 권리에 대한 해석은 법리에 대한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체결, 권리 이전, 저작권 분쟁 예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귀속 문제에서부터 침해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지식재산권·콘텐츠 산업 규제 분야에서 학계와 실무를 오랫동안 넘나들며 전문성을 쌓아온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저작권 사안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접목된 최신 저작권 이슈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