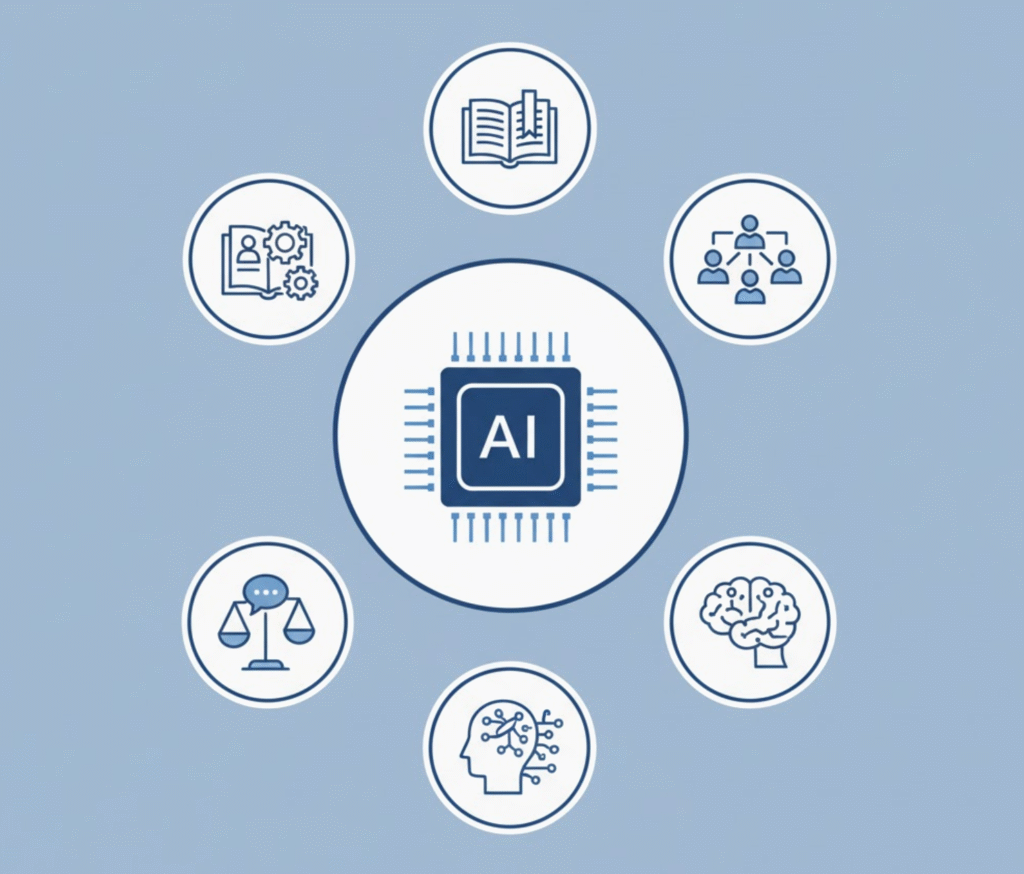
두 개의 보고서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가트너는 2026년부터 주목해야 할 AI 전망 10가지를, 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네이티브’ 세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보고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가장 높은 나라, 한국
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8-24세 ‘AI 네이티브’ 세대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대치를 보였습니다. 90%가 “회사가 AI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태 평균(78%)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디지털 선진국인 싱가포르(87%)보다도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 92%가 “AI 역량이 취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답한 겁니다. 가트너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7년까지 기업 채용의 75%가 AI 역량 테스트를 포함할 거라고요. AI를 못 쓰면 취업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김채곤 줌 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의 AI 네이티브 세대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기대 수준은 이미 미래에 와 있습니다.
역설의 시작, AI 쓰는 능력과 AI 안 쓰는 능력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등장합니다.
가트너는 2027년까지 기업 채용의 75%가 AI 역량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2026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50%가 ‘AI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평가한답니다. AI 쓰는 능력도 보고, AI 안 쓰고 생각하는 능력도 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ChatGPT한테 물어보면 뭐든 답은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답을 그대로 쓰는 사람과, 자기 머리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트너는 “생성형 AI 사용으로 인한 비판적 사고력 저하”를 우려합니다. 금융, 의료, 법률 같은 고위험 산업에서는 ‘진짜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다릴 플러머 가트너 애널리스트는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술만 쫓아가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속도를 원하지만, 공감도 원한다
한국의 AI 네이티브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91%가 “AI 챗봇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빨라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86%는 “인간 상담사와의 연결”도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빠르면서도 따뜻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주문이죠.
가트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28년까지 고객 대면 프로세스의 80%에 다중 에이전트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거래요. 하지만 그건 AI가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인간은 복잡하고 감정적 요소가 중요한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와 사람이 협력하는 겁니다.
줌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 AI 네이티브의 42%는 “일반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AI 응답”을 브랜드 충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단순하고 기계적인 자동 응답은 싫다는 겁니다. 더 똑똑하고 인간적인 AI를 원합니다.
김채곤 지사장은 “AI의 효율성과 인간의 공감 능력을 결합한 고객 경험이 한국의 AI 네이티브 세대가 기대하는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런데 역설적인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AI 네이티브 중 AI 챗봇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39%에 불과합니다. 아태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나와 있는 AI 챗봇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지능형 상호작용”을 원하는 거죠.
한국 시장은 까다롭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자동화되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쓰지 않습니다.
AI가 AI를 고용하는 시대
가트너는 더 먼 미래도 내다봤습니다. 2028년이면 B2B 거래의 90%를 AI 에이전트가 처리한답니다. 규모가 15조 달러래요.
사람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명함 주고 커피 마시는 시대는 끝납니다. AI가 AI한테 “이 제품 얼마에 팔래?” 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영업 주기가 확 줄어듭니다.
2030년이면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금전거래의 22%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가 된답니다. 돈 자체에 “이런 조건이면 자동으로 결제해라” 같은 규칙을 넣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돈을 쓰고 버는 ‘경제적 주체’가 되는 거죠.
공상과학 같지만, 가트너는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스테이블코인, 토큰화된 자산이 기업용 주류 금융 상품이 된다는군요.
생산성 도구 시장, 30년 만의 대격변
2027년까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가 580억 달러 규모의 생산성 도구 시장을 뒤흔든다고 가트너는 전망합니다. 30년 만의 가장 큰 변화래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같은 도구들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과거 파일 형식이나 호환성이 중요하지 않아지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업체들이 마구 쳐들어올 겁니다. 유료 기능을 무료로 푸는 업체도 나오겠죠.
줌이 AI 컴패니언을 유료 계정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것도 이런 흐름의 일부입니다.
글로벌 AI는 없다, 지역 AI만 있을 뿐
가트너는 2027년까지 전 세계 국가의 35%가 자국 특화 AI 플랫폼에 묶인다고 전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요. 범용 AI라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AI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줌의 조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 AI 네이티브는 아태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기대치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디지털 문화와 기대 수준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골치가 아플 겁니다. 나라마다 다른 AI 플랫폼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세대 간 격차도 문제다
줌의 조사에서 재미있는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AI 도구 제공에 대한 기대에서 한국의 AI 네이티브(90%)와 비네이티브 세대(74%) 간 격차가 16%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아태 평균 격차(1%포인트)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젊은 세대는 AI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기성세대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려 사항은 비슷합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AI 네이티브(53%)나 비네이티브(55%)나 똑같이 걱정합니다.
차이는 태도입니다. AI 네이티브는 기술의 한계를 빠르게 인지하고 적응합니다. 비네이티브는 더 많은 설명과 교육,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김채곤 지사장은 “AI 네이티브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통합형 AI 도구를, 비네이티브 세대에게는 신뢰 형성을 위한 충분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규제와 소송의 홍수
가트너는 2026년까지 ‘AI발 사고’ 소송이 1,000건을 넘는다고 전망합니다. 이미 AI 때문에 사고가 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AI를 씁니다” 또는 “우리는 AI를 안 씁니다”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답니다. 소송 리스크를 줄이려면 투명하게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규제도 우후죽순입니다. 2027년이면 전 세계 경제의 50%가 파편화된 AI 규제의 영향을 받고, 이를 지키려고 50억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AI 관련 법안이 1,000건 넘게 나왔는데, 문제는 AI가 뭔지에 대한 정의조차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줌도 ‘책임 있고 목적 있는 기술 활용’을 강조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품질의 AI 결과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두 보고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가트너의 다릴 플러머가 강조한 “행동 양식의 변화”와 줌의 김채곤 지사장이 말한 “속도와 공감의 균형”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술만 도입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특히 한국처럼 AI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시장에서는 이 균형이 더욱 중요합니다. 빠르면서도 공감할 줄 알고, 자동화되면서도 인간적인 경험. 어려운 주문이지만, 이게 바로 한국의 AI 네이티브 세대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AI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가, AI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기업들은 AI 네이티브 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