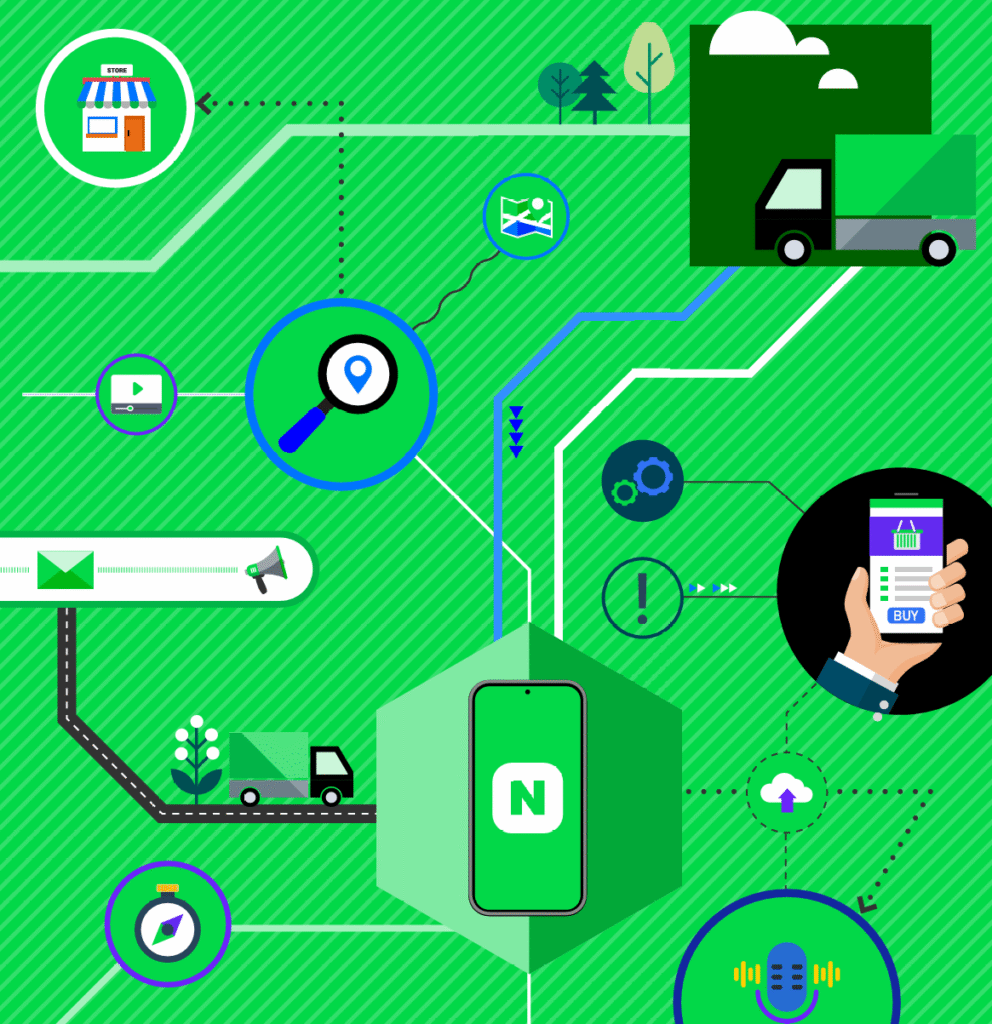
KAIST, 6000명 조사로 무료 서비스의 실제 가치 첫 측정 GDP 8.7~17.5% 규모…제롬 파월 “디지털 가치 누락” 경고 현실로
종이지도를 사던 시대는 끝났다. 백과사전을 사는 사람도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지도를 쓰고, 훨씬 더 방대한 지식에 접근한다. 무료로.
여기 역설이 있다. 우리 삶은 분명 풍요로워졌는데, 국내총생산(GDP)에는 이 가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19년 “디지털 서비스 가치가 공식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측정됐다. 규모는 최소 222조원. 2024년 한국 GDP(약 2550조원)의 8.7~17.5%에 달한다.
1년간 네이버 검색 못 쓰면 얼마 줘야 하나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와 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혁신연구소는 지난 7월 한국인 6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질문은 간단했다. “1년간 이 서비스를 못 쓰는 대가로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1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무작위로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물었다. 미국 MIT에서 개발해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이다.
결과는 주목할 만했다. 한국인 1명이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매기는 연간 가치는:
△검색엔진 1220만원(네이버 검색 704만원) △디지털 지도 857만원(네이버 지도 428만원) △이메일 273만원(네이버 메일 139만원) △전자상거래 316만원(네이버 쇼핑 97만원).
“네이버만 222조…카카오·구글 포함하면 훨씬 더 커”
개인의 가치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면 숫자는 더 커진다.
2024년 인터넷 이용자 수(약 3164만명)와 서비스 이용률을 곱해 계산한 결과, 네이버 서비스가 창출하는 연간 소비자 후생(사용자가 실제로 누리는 경제적 혜택)은 △검색 222.65조원 △지도 131.50조원 △이메일 43.05조원 △쇼핑 24.19조원 등 총 222~447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네이버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 규모이며, 카카오, 구글, 유튜브 등을 모두 포함하면 한국 디지털 경제의 실제 가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 전체의 연간 생산 규모보다 2배 이상 큰 가치가 ‘무료’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GDP에는 0원으로 잡힌다.
미국선 검색엔진 2426만원…세계적 현상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 검색엔진 전체 가치를 1인당 1만7530달러(약 2426만원), 이메일을 8414달러(약 1164만원)로 측정했다. 네덜란드는 2019년 왓츠앱 가치를 6429유로(약 962만원)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한국 결과가 미국, 네덜란드와 정성적으로 일치한다며, 디지털 가치가 GDP에 포착되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이지도 사라지자 GDP는 줄고…실제 가치는 폭증
보고서는 GDP 중심 정책이 디지털 시대의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종이 지도를 사던 소비자들이 무료 디지털 지도로 전환하면 지도 시장의 GDP는 감소한다. 하지만 디지털 지도의 실제 가치는 1인당 857만원으로, 종이 지도보다 훨씬 크다. 가치는 폭증했지만 GDP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잡히는 역설이다.
인쇄 백과사전, 음반 산업도 마찬가지다. GDP로만 보면 ‘쇠퇴’했지만, 실제로는 무료 검색과 스트리밍이 소비자 후생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연구진은 만약 정책 당국이 “지도 산업이 쇠퇴하니 보호해야 한다”며 디지털 지도를 규제한다면, 131조원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관분석 29조 vs 실제 가치 222조…7.7배 차이
일각에서는 디지털 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산업연관분석으로 추산한다. 연구진이 별도로 실시한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네이버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9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접근의 한계를 지적한다. 산업연관분석은 전통적 ‘생산’ 관점의 측정이며, 디지털 경제의 진짜 가치인 ‘사용자 후생’은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산 관점 29조원과 사용자 후생 222조원. 7.7배 차이가 난다.
보고서는 굴뚝 산업의 잣대로 디지털 경제를 측정하는 것은 본질적 오류이며, 플랫폼의 가치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 있다고 강조했다.
“GDP는 20세기 지표…소비자 잉여가 21세기 척도”
연구진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다.
첫째, 디지털 서비스 규제 전 ‘소비자 잉여 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색, 지도 같은 디지털 필수재에 대한 정책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GDP를 보완하는 새로운 경제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디지털 후생을 측정하고 공표하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라도 사회적 가치는 막대하므로, 현대판 ‘공공재’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GDP가 20세기 제조업 시대의 지표라면, 소비자 잉여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척도라고 밝혔다.
쿠즈네츠의 90년 전 경고 “GDP로 후생 못 재”
아이러니하게도 GDP 개념을 만든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1934년 이미 경고했다. “국가의 후생은 GDP로 거의 측정할 수 없다.”
90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절실해졌다.
종이지도가 사라지며 GDP는 줄었지만, 우리 손에는 전 세계 지도가 들어있다. 백과사전 살 돈 없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 누구나 모든 지식에 접근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 시대. 한국 디지털 경제의 ‘보이지 않는 222조원’은 그 시작점일 뿐이다.

![[BLT칼럼] 엔젤투자의 3가지 즐거움 1114b3aee2b12](https://platum.kr/wp-content/uploads/2025/11/1114b3aee2b12-150x15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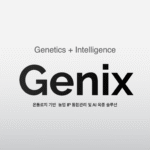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