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트머스의 창시자들은 무엇을 맞히고, 무엇을 틀렸나.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

1956년 여름, 뉴햄프셔의 다트머스 대학교. 열 명 남짓한 학자들이 여름 내내 캠퍼스를 드나들었다. 끝까지 남은 건 세 명뿐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예언자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있었을 뿐이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약속
존 매카시는 스물여덟이었다. 젊은 수학자였던 그가 록펠러 재단에 제출한 워크숍 제안서에는 대담한 문장들이 박혀 있었다.
“학습의 모든 측면, 혹은 지능의 모든 특성은 원칙적으로 기계가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게 기술될 수 있다.”
그들의 자신감은 놀라웠다. 제안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중하게 선발된 과학자 그룹이 한 여름 동안 함께 연구한다면, 이 문제들 중 하나 이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 여름. 8주.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매카시와 민스키, 섀넌과 로체스터는 이 새로운 분야에 이름을 붙여야 했다. 기존의 ‘사이버네틱스’나 ‘오토마타 이론’으로는 부족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작게 시작할 생각이 없었다.
성적표
그로부터 70년. 한 여름의 돌파구는 오지 않았다. 대신 기나긴 마라톤이 시작됐다.
다트머스 이후 낙관론은 오히려 더 커졌다. 1965년 허버트 사이먼은 “20년 안에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선언했다. 1967년 민스키는 “한 세대 안에 인공지능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두 번의 ‘AI 겨울’이 찾아왔다. 예산이 끊기고 연구실이 문을 닫았다.
시간표는 틀렸다. 완전히.
그러나 방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제안서에서 그들이 꼽은 핵심 과제는 “기계가 언어를 사용하고, 추상화와 개념을 형성하며, 스스로를 개선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70년 후, AI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었다. 언어. 추상화. 자기 개선. 다트머스의 키워드가 그대로 2020년대의 키워드가 됐다.
ChatGPT가 세상을 뒤흔든 2022년, 다트머스의 유령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우리가 말했잖아. 반세기 이상 늦었을 뿐이야.
예상 밖의 승리
AI는 성공했다. 그러나 다트머스가 상상한 방식은 아니었다.
1956년의 질문은 분명했다. 기계가 인간처럼 이해할 수 있는가. 제안서는 “문제를 푸는” 기계, “개념을 형성하는” 기계를 꿈꿨다. 지능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것을 기계에 이식하는 것. 그게 목표였다.
하지만 2024년의 AI는 다르게 작동한다. GPT는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다. 통계적 패턴을 학습해서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생성’할 뿐이다. 철학자들이 꿈꾼 ‘사고하는 기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그게 작동한다.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 없는 생성이 이해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다트머스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이다. 지능의 본질을 밝히겠다던 원래 목표는 여전히 미완이다. 기계가 정말 ‘생각’하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철학적으로는 패배다. 하지만 공학적으로는 압도적 승리다.
예상 밖의 전환
변화는 기술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다.
매카시와 민스키는 학자였다. 그들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진리를 탐구했다. 다트머스 워크숍은 학술 공동체의 산물이었다. 학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눴고, 논문은 공개됐으며, 지식은 공유됐다.
지금은 다르다. AI의 주도권은 기업이 쥐고 있다. 오픈AI, 구글, 앤스로픽, 메타. 연구의 방향은 연구실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샘 알트만은 매카시의 후계자이되,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한 명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다른 한 명은 “이 기술을 어떻게 10억 명에게 배포할 것인가”를 묻는다.
주도권이 옮겨가자 지식의 흐름도 달라졌다. 오픈AI는 더 이상 ‘오픈’하지 않다. 모델 가중치는 기업 비밀이 되었고, 데이터셋은 성벽 안에 갇혔다. 메타가 라마를 공개하며 오픈소스를 외치지만, 순수한 공유인지 전략적 견제인지는 불분명하다.
철학이 산업이 됐다. 호기심이 비즈니스 모델이 됐다. 수조 달러가 움직이고, 국가 전략이 수립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겨난다. AI는 더 이상 소수 학자들의 지적 유희가 아니다.
70년 전 다트머스의 여름은 이미 전설이 됐다. 하지만 전설을 만든 이들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 어쩌면 질문 자체가 바뀌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기계가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기계가 작동하는가다.
1956년 다트머스 워크숍의 주역들 중 마빈 민스키는 2016년 1월, 존 매카시는 2011년 10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ChatGPT를 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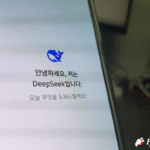
![[BLT칼럼] 알래스카 LNG가 던진 질문, 바다 위 LNG 공장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b05d1ed55e524](https://platum.kr/wp-content/uploads/2026/01/b05d1ed55e524-150x150.pn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