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네이버에서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언론과 미디어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3여년전 3대 메이저 신문사를 포함한 국내 모든 언론사가 고작 한 포탈의 1인치를 두고 싸움을 벌이더니 급기야 이쁘게 포장된 1인치에 일부미디어는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정보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인터넷시대의 시작과 함께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이제는 아날로그적 감성 운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종이신문을 받아볼 이유가 없어졌다.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가장먼저 알려주는것이 언론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보수적 프레임에 갇혀 그 어떤 살길도 찾아내지 못했다.
언론의 보수성보다 더 보수적인 집단이 바로 예술계이다. ‘창조적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배는 고플지언정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예술가적 기질이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집단에게 디지털은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창작품이 낮은 퀄리티의 기계적언어로 무한 배포되는 것을 곱게 볼리가 없다.
과거 메이저 음반사들은 음원의 가치와 비전을 평가절하했고 지금 음악산업에서의 승자는 음반사도 가수도 아닌 음원제공사이다. LP와 CD의 음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MP3를 누가 듣겠냐며 큰소리 치던 음반사는 이제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고 음원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가수와 작곡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운로드당 몇십원의 음원수익으로는 노래를 부를수 없다. 그렇게 그들은 드라마와 예능에 출연하고 있다.
자. 이제 다음 차례를 고민해보는건 어떨까.
미술작품의 디지털화(복제와 배포). 뮤지엄을 위시한 다양한 미술작품 유통관계자는 여전히 손사레 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 작품을 파는것이 최대수익모델인 갤러리는 이미 매매가 없어 악세서리니, 플리마켓이니 하며 궁여지책으로 운영을 하고있다. 언론사와 음반사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예술계의 유통사들이 착각하는것 한가지는 대중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본인의 자부심과 작가의 작품에 대한 예의일수도 있으나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대중이라면 예술가의 작품과 대중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술가들 만큼 기민하거나 섬세하지 못하여 그들의 의도에 절반도 알아 채지 못한다. mp3와 LP의 음질차이를 시시콜콜 따져들지 않는다. 혹 잭슨폴락의 그림이 당신의 창고에 있었다면 당신은 1300억을 휴지통에 버렸을지도 모른다.
어떤 콘텐츠가 혹은 산업이 디지털화 되는 흐름속에서 거스르기보다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쉽게 복제되고 배포되는 디지털콘텐츠는 그만큼 대중에게 친숙해질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것은 분명 미래에 ‘진품의 가치’를 재평가 하게 해줄것이다. 또한 디지털화 시대에 아날로그적 문화 역시 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여전히 서점에가고 홍대 재즈바를 찾으며 고흐의 작품보러 미술관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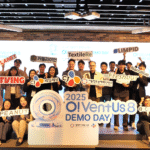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