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 협업 솔루션 개발사 ‘스페이셜’은 2010년 3D 소프트웨어 ‘범프탑(Bumptop)’을 구글에 매각한 아난드 아가라왈라 대표, MIT미디어랩과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의 이진하 공동창업자(최고제품책임자, CPO)를 중심으로 설립된 실리콘앨리 스타트업이다.
스페이셜이 IT업계에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올해 MWC 때다. 아난드 아가라왈라 대표와 다른 공간에 있는 이진하 CPO가 원격 회의를 하는 데모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모니터 화면을 벗어나 AR 아바타와 음성 UI를 통해 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회의 모습은 큰 화제를 모았다.
스페이셜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AR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AR 기반 원격 협업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버 창업자 개럿 캠프, 징가 창업자 마크 핑커스, 삼성넥스트 등 글로벌 파트너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고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도 투자유치를 했다.
2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주최로 개최된 ‘실리콘밸리의 한국인2019’ 행사서 이진하 CPO가 자신의 창업전후 과정을 이야기 했다.
이 CPO는 디자이너이자 공학자로, MIT 미디어랩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최연소 수석연구원과 그룹장을 거쳐 창업자로 나선 인물이다. MIT 미디어랩 재학 당시 손을 화면 안에 넣어 조작 할 수 있는 3차원 컴퓨터 스페이스탑(SpaceTop), 만질 수 있는 픽셀 제론(ZeroN) 등의 작업으로 화제가 되어, TED 에 초청받아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하 강연 정리.

컴퓨터와 모니터의 한계를 벗어난 기술을 구현하다.
여러사람과 협업을 하거나 과제를 할 때 컴퓨터와 모니터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남을 가진다. 하지만 전문가와 팀원이 전세계에 퍼져있다면 이마저도 어렵다. 여러 영상 툴로 회의를 하지만 스크린 내부에서 하는 대화는 한계가 있다. 일단 한 방향으로 대화가 흐를 수 밖에 없다. 스페이셜의 비전은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효율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다.
3주 전 MWC2019에서 MS의 초청을 받아 홀로렌즈2 위에 이 기술의 데모를 했다. 아난드 아가라왈라 대표는 무대에 서고 나는 그 뒤에 있는 깜깜한 방에서 아바타로 나섰다. 그 자리에서 파트너사인 마텔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스페이셜의 증강현실 협업 플랫폼을 소개했다. 홀로렌즈로 구현했지만, 우리 기술은 컴퓨터와 핸드폰만 있어도 AR공간 안에 구현할 수 있다.
기술적 백그라운드와 디자인의 결합을 꿈꾸다.
개인적으로 자연을 좋아하고, 표현하고 그리기를 즐기며 유년기를 보냈다. 이공계가 내 길이라 생각해서 유학(도쿄대 전자공학과)을 갔다. 방황이 있었다. 공학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내 본질은 디자인과 예술쪽이라는데 있더라. 그래서 기술적 백그라운드와 개인 성향의 결합이 가능한 MIT미디어랩에 들어갔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말한 컴퓨터 학자 앨런 케이가 이 곳의 교수다.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걸 했다.
컴퓨터 스크린은 항상 한계가 있다고 봤다.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스크린이 아닌 공간에서 사람들이 직접 인터렉션할지를 고민했다. 7년전 투명 스크린과 키넥트를 연결해서 공간 기억력으로 멀티테스킹이 되게 했다. 생각하는 스페이스가 2D에서 3D가 됐기에 더 확장된다고 봤다. 다만 그래픽을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더라. 그걸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서 만든게 제로온이라는 물리 인터페이스다. 작은 공간에 쇠구슬을 픽셀로 활용해 3D픽셀을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상호작용을 하게 한거다. 스크린 안에 죽어있는게 아니라 실제 공간에 정보가 살아있게 하고 싶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스크린 안에 정보를 함께 자유롭게 보고 활용하게 하는거였다. 사람들이 가진 정보를 같이 쓸 수 있는 미래가 올거라 생각했다.
돈 벌 계획없이 2년 6개월 전 창업했다.
위에서 말한 작업을 하다보니 운 좋게도 테드 등 여러 미디어에서 발표를 했다. 그게 계기가 되어 같은 생각,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중 한 명이 스페이셜 공동창업자인 아난드 아가라왈라 대표다. 그는 12년 창업해 3D 소프트웨어 ‘범프탑’을 구글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아가라왈다와 만나 컴퓨팅의 미래를 이야기했고 정보를 공유하며 언젠가 함께하자고 했다. 첫 만남 후 3년 뒤 스페이셜을 함께 창업했다. 그때가 홀로렌즈가 처음 나올 때 였는데, 그걸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다. 우선 증강현실의 상용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생각보다 소비자 시장이 빨리 오는게 보였다. 그리고 UX를 다시 써야한다는 것도 예견되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했다. 당시 어떻게 돈을 벌지는 고민하지 못 했음에도 우버창업자와 삼성넥스트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했다. 감사한 일이었다.
창업 후 우선 공간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다. 큰 공간을 활용하는, 스크린보다 좋은 UI를 고민했다. 같은 공간에 없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형태를 구현하려 했다.
헤드셋 AR에 집중하는 이유
‘안경형AR, 핸드폰형AR이 아니라 헤드셋 AR으로 왜 갔냐’는 질문 많이 받는다. 시장 침투 대비 혁신의 크기를 고민했다. 헤드셋AR은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UX를 바꿀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봤다. 모바일은 아무리 잘 해도 줄 수 있는 UX의 차이와 한계가 분명하다. 임팩트의 크기 차이다. 헤드셋이 비싸고 어렵지만 제대로만 구현해 낸다면 무어의 법칙처럼 증가할거라 판단한거다.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임팩트가 크다고 봤다. 다양한 실험을 하며 확신아닌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작년 10월 AR 협업 솔루션을 론칭했다. 사진 한 장으로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다같이 정보를 시각화하고 서치하며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어디까지 갈지 우리도 잘 모른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렇다’라고 보여주기 시작한 단계다. 다행스러운 건 론칭 이후 의학계를 비롯해 마텔, MS 등 여러 기업에게서 연락을 받고 있다. 우리도 그들에게서 많은 걸 배우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다.
창업은 언제 하는가
창업은 마켓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맞다. 모든 것이 타이밍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조금 다르다. 개인적으로 10대 때 하고싶은 일을 하느라 고민했고, 20대는 잘 한다는 말을 들으려 뭔가를 했고, 30대에는 잘 하는 것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순서가 거꾸로 였다면 아마 지금 이 일을 못 했을거다. 성공에 대한 고민 이전에 창업자 자신의 성향과 색깔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후에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 본인이 꿈꾸는 스타트업이 더 흥미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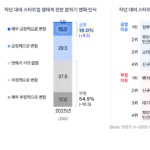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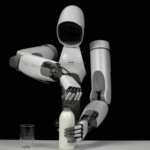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