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두, 자율주행 기술 노선 전면 전환… 순수비전 방식 채택
- 다중 센서 융합에서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선언
- 테슬라 추격 위한 전략적 선택… 비용 절감과 시장 선점 동시 추구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방향을 순수비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리옌홍(李彦宏) 바이두 CEO는 최근 사내 강연에서 자사 로보택시 플랫폼 루오보콰이파오(萝卜快跑)의 기술 노선을 기존 다중 센서 융합 방식에서 카메라 기반 순수비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리 CEO는 “구진무실(求真务实·진리 추구와 실효 강조)”이라는 주제의 내부 강연에서 “로보택시가 순수비전 노선으로 전환해야만 기회가 있다”며 “테슬라의 순수비전 방식이 완성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바이두에게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는 웨이모, 포니닷에이아이(Pony.ai) 등 주요 업체들이 레이더, 라이다(LiDAR),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는 융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 순수비전 자율주행 기술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다.
바이두의 이번 결정은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 패러다임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테슬라가 구축한 순수비전 기술 생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루오보콰이파오는 2021년 출시 이후 베이징, 우한, 충칭, 선전,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누적 1,100만 회 이상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바이두는 그간 순수비전과 다중 센서 융합 방식을 병행 개발해 왔으며, 아폴로(Apollo) 순수비전 레벨 2+ 솔루션을 일부 양산 차량에 이미 적용한 바 있다.
바이두가 순수비전 방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2018년 수만 위안(약 1,000만원 이상)에 달했던 라이다 센서 가격은 현재 약 3,000위안(약 58만원)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기술 세대교체가 빈번해 감지 모델의 재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카메라 기반 비전 시스템은 하드웨어 비용, 데이터 가공 비용, 모델 확장성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다. 실제로 루오보콰이파오 6세대 무인차량의 단가는 20만 4,600위안(약 3,965만원)으로 5세대 대비 약 60% 저렴해졌다.
바이두는 무인차량 탑승 비용을 현재 택시 요금의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하드웨어 비용 절감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두의 전략 전환은 중국 정부의 ‘차량-도로-클라우드 일체화'(车路云一体化) 정책과 맞물려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책에 따라 도로 측 센서와 클라우드 협업이 허용되는 중국 시장에서는 순수비전 시스템이 도로 인프라의 보조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이 순수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순수비전 기술의 성공 여부는 결국 데이터 축적 경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전 세계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통해 막대한 양의 실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반복 학습 속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두는 고품질의 레벨 4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BEV(Bird’s Eye View)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있지만, 테슬라 대비 데이터 규모의 한계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극한 기후나 도심 외곽의 복잡한 환경 등 특수 상황에서는 다중 센서 융합 방식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상당 기간 두 기술 노선이 공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는 “바이두의 순수비전 전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라면서도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두의 이번 결정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업계 전반의 재검토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테슬라와의 기술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샘스클럽, 중국 내 ‘회원제 프리미엄’ 이미지 흔들
- 대중 브랜드 제품 도입으로 중산층 전용 정체성 위기
- 급속 확장 속 품질 관리 한계 노출… 브랜드 차별화 전략 재검토 불가피
중국에서 월마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홀로 급성장세를 이어가던 샘스클럽이 브랜드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출시한 일부 대중 브랜드 제품이 기존 ‘중산층 전용 프리미엄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달 중순 샘스클럽이 새롭게 선보인 저당 오리온 초코파이, 무뼈 오리발, 판판 프렌치 슈크림빵, 푸룬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중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대중 브랜드로,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
특히 회원들의 분노를 자극한 것은 이러한 제품 출시와 함께 기존 인기 상품인 타이양빙(太阳饼), 라이스푸딩, 저당 에그파이 등을 철수시켰다는 점이다.
회원들은 즉각 온라인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연간 260위안(약 5만원)에서 680위안(약 13만원)의 회원비를 내고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을 굳이 대량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샘스클럽은 7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제품 선택에 대한 온라인 논의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매장에서는 첨가물 성분과 칼로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저당 초코파이를 긴급 철수시키기도 했다.
이번 비판은 단순한 제품 구성에 대한 불만을 넘어 브랜드가 상징해온 ‘중산층 전용 프리미엄 이미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샘스클럽은 중국 시장에서 엄선된 상품, 유료 회원제, 대용량 패키지, 높은 객단가 전략을 앞세워 중산층 이상의 대가족을 주요 타깃으로 삼으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러한 전략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대중 마케팅보다 입소문을 통한 자연스러운 회원 유입과 높은 회전율을 이끄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효과는 분명했다. 2025년 춘절 시즌 동안 샘스클럽의 중국 내 유료 회원 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신규 유입 고객 중 40% 이상이 기존 소비자들의 자발적 추천을 통해 가입했다.
샘스클럽은 ‘대형 매장 + 클라우드 물류센터’ 모델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신규 시장 진출 시 ‘선물류센터 개장, 후매장 오픈’ 방식을 채택해 오프라인 매장이 열리기 전에 물류창고를 먼저 구축하고 있다.
이는 회원들이 사전부터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2024년 샘스클럽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50%를 넘어섰으며 전자상거래 거래액만으로도 400억 위안(약 7조 7,000억원)을 돌파했다.
연회비 260위안으로 계산할 때 샘스클럽은 연간 23억 4,000만 위안(약 4,535억원) 이상의 회원 수익을 거두는 셈이다. 이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순수익’에 가까운 구조로, 현재 중국 내 13개 상장 유통기업 중 절반만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지만 이 모델의 전제는 연회비 260위안이 단순한 입장료가 아니라 ‘소비 수준’과 ‘품격’을 상징하는 사회적 지위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샘스클럽이 중국 시장 내 고속 확장을 지속하면서 공급망 안정을 우선시한 전략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정체성의 훼손’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중 브랜드와의 협업을 늘리며 상품 라인업은 풍부해졌지만, 동시에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경험’은 약화되고 있다는 소비자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빠른 확장이 품질 통제 능력을 앞질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샘스클럽의 배송서비스 지쑤다(极速达)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품 보관과 배송의 변수가 많아져 품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샘스클럽은 2025년 이후 연평균 8~10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중산층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통업계 전문가는 “샘스클럽의 성공은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정체성 구축에 기반했다”며 “급속한 확장 과정에서 이러한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샘스클럽은 이제 품질과 신뢰, 브랜드 정체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확장 속도와 브랜드 가치 보존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파산 1세대 전기차 스타트업, 새 투자자 주도로 재기 시도
- 2025년 양산 재개 목표… 해외 진출과 B2B 전략으로 돌파구 모색
파산 위기에 몰렸던 1세대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WM Motor, 威马)가 새로운 투자자의 주도 하에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 전 웨이마 직원이 미디어 밍징PRO(明镜Pro)에 공개한 ‘뉴 웨이마자동차 공급업체 대상 백서’에 따르면, 웨이마는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 및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새로운 투자자인 선전 샹페이 자동차판매 유한공사(深圳翔飞汽车销售公司)는 백서를 통해 “2025년 4월 3일 상하이시 제3 중급 인민법원이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웨이마의 4개 주요 계열사를 공식 인수했다”고 밝혔다.
샹페이는 현재 원저우(温州) 공장을 통해 EX5와 E5 모델의 양산 재개를 전력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웨이마는 올해 9월까지 두 모델을 재출시하고 연간 최소 1만 대에서 최대 2만 대 생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웨이마의 재기 전략은 국내 시장 복귀와 해외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태국에 KD(Knock Down) 공장을 설립해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연간 1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향후 5년간 1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도 공개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에 기반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2026년 수출 비중을 전체 생산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웨이마는 기존 개인 소비자 중심에서 벗어나 B2B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기존 고객 대상 차량 교체 혜택 제공, 기업·관공서·차량공유 플랫폼과의 B2B 맞춤 공급, 차량 리스 및 단기 렌터카 시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는 개인 소비자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B2B 시장에서 재기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웨이마는 2015년 전 지리(吉利) 고위 임원 출신인 선훼이(沈晖)가 설립한 대표적인 1세대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선훼이는 볼보 인수 및 글로벌 재편을 지휘한 인물로, 웨이마의 초기 투자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텐센트, 바이두, 리카싱 재단(李嘉诚基金) 등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350억 위안(약 6조 7,840억원) 이상을 유치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부터 판매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무리한 가격 전략 조정으로 2022년 판매량은 3만 대 미만으로 주저앉았다. 2023년에는 바이두 아폴로(Apollo)와의 역합병 상장도 무산되면서 법원에 기업 구조조정을 신청하며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샹페이는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차량 판매업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오넝자동차(宝能汽车)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법인의 실소유주는 바오넝자동차 자회사와 지분 관계로 연결된 황징(黄晶)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업계에서 제기됐던 ‘바오넝이 웨이마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바오넝자동차는 중국 부동산 대기업 바오넝그룹의 자동차 사업 부문으로, 상당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다.
뉴 웨이마의 부활 시도는 구조조정, 정부 지원, 해외 진출 전략,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 샇페이의 지원이 결합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샹페이의 실체와 바오넝의 지원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 BYD, 니오(NIO) 등 기존 전기차 기업들의 강세 속에서 웨이마가 실제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웨이마의 재기 시도는 의미 있는 도전이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과거 실패 요인들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웨이마의 재기 시도가 성공할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귀결될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실제 성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86℃ 컵에 담은 ‘빙화’ 체험… 50분 대기도 마다않는 중국 젊은층
- 상하이서 시작된 트렌드, 전국 확산… 경험형 소비의 새로운 표본
40℃를 웃도는 상하이의 폭염 속에서도 50분 이상을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선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86℃ 아이스컵 더티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다. 최근 상하이 용캉루(永康路)에 문을 연 소형 커피숍이 이색적인 초저온 커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전국적인 유행을 이끌고 있다.
상하이의 ‘산리팡 말코닉(三立方-Mahlkönig) 더티 전문점’은 개점 한 달도 되지 않아 중국 대표 리뷰 플랫폼 따중뎬핑(大众点评) 커피 부문 인기순위 1위에 올랐다. 이 커피는 -86℃까지 냉각한 유리컵에 특제 우유를 붓고, 그 위에 따뜻한 에스프레소를 부어 만드는 더티커피다.
컵 벽에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서리와 차가운 우유, 뜨거운 커피가 입 안에서 동시에 퍼지는 빙화(氷火) 체험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후각과 시각, 미각을 동시에 사로잡았다.
이 가게의 핵심은 ‘-86℃의 아이스컵’이다. 실험용 냉동 장비로 사전에 냉각한 전용 유리컵에 우유를 붓자마자 눈처럼 하얀 유백색 막이 형성된다. 이후 뜨거운 커피를 붓고 40초 내에 마시는 것이 핵심이다. 컵 아래 남은 우유 거품은 숟가락으로 떠먹는 ‘디저트형 커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상하이를 넘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난징, 청두, 따롄, 쑤저우, 리우저우 등 전국 각지의 독립 커피숍들이 잇따라 -80℃에서 -196℃에 이르는 초저온 커피를 선보이며 트렌드에 합류하고 있다.
쿤밍의 위엔저상꼬우(愿者上钩)에서는 블루베리나 파인애플잼을 곁들인 차가운 더티로 디저트 커피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따롄의 커피트론(Coffeetron)은 -196℃ 액체질소로 급속 냉각한 컵을 사용해 드라마틱한 안개 연출과 소리까지 살아있는 커피로 주목받고 있다.
샹탄(湘潭)의 한 매장은 얼음을 컵으로 사용하는 ‘아이스블럭 커피’를 선보이며 커피와 빙수가 결합된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 초저온 더티는 전혀 새로운 발명은 아니다. 커피 페스티벌 등에서 유사한 제품이 존재했지만, 올해 유난히 심한 폭염과 SNS 기반의 시각적 바이럴이 촉진되며 전국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소비자들이 단지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하고 인증하고 싶어하는 시대임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86℃로 냉각된 컵에서 피어오르는 냉기, 딱딱하게 얼어붙은 우유, 이를 숟가락으로 퍼먹는 과정까지 모든 순간이 SNS용 콘텐츠가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유행의 양면성도 지적한다. -86℃를 구현하기 위한 실험용 냉동 장비와 전용 내한 유리컵 설치비가 수십만 위안에 달하며, 제품 라인업이 단조롭고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확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장 간 표준화도 난제로 꼽힌다. ‘진짜 -86℃인가?’, ‘얼음이 너무 차서 입술에 닿으면 괜찮은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립 커피숍들이 대형 프랜차이즈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전략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어필하고 있다.
한 외식업계 전문가는 “초저온 커피 열풍은 중국 젊은층의 소비 패턴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경험형 소비’가 주요 트렌드로 떠오른 지금, 단순히 커피의 맛이 아닌 마시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인 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됐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트렌드가 일시적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커피 문화로 정착할지 주목하고 있다. 초저온 더티커피 열풍은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SNS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현상으로, 향후 F&B 업계의 마케팅 전략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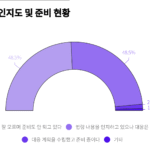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