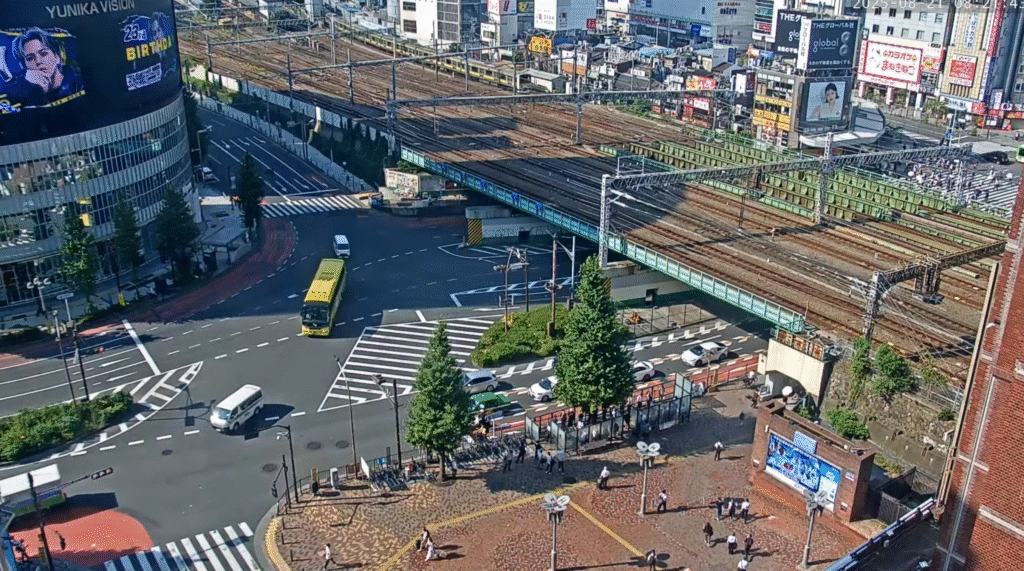
2022년 아시아 한국인 행사에서 최대헌 달콤소프트 일본 지사장은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은 계획에 있던 일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계획에 없고 매뉴얼이 없으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한국에서 3개월 걸릴 일이 일본에서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우리는 저작권 등 이슈가 그랬다. 일본에서는 아티스트 음원으로 게임이 출시된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매출이 나서 정산이 되는지를 이해시켜야 했다.”
이 말은 일본 진출의 본질을 압축한다.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의 철저한 검증, 선례가 없을 때의 신중함. 일본은 한국과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는 게임판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176개의 한국 기업이 일본에 법인을 설립한다. 2024년만 231개였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계산해보면 성공률은 0.5%에 불과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원티드가 일본 진출 기업 44곳을 조사한 결과는 더욱 시사점이 크다. 75%가 “시장 유사성” 때문에 일본행을 결심했지만, 정작 현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 형성”(59.1%)이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먼 것이었다는 역설이다.
그래도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세 가지 뚜렷한 패턴이 보인다.
변신의 기술: 채널톡은 오프라인 분석 도구에서 온라인 채팅 서비스로, 강남언니는 헬스케어 앱에서 미용 플랫폼으로 변신했다. 일본에서는 고집보다 유연성이 생존 전략이다.
틈새의 발견: 누구는 일본 인플루언서들이 오프라인 중심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이커머스 진출을 도왔다. 캐플릭스는 모두가 도쿄를 노릴 때 오키나와부터 시작해 지자체 협력을 이끌어냈다.
현지 파트너: 타임트리는 카카오재팬 출신들이, 올거나이즈는 야후재팬 경험자가 처음부터 합류했다. 베어로보틱스는 아예 소프트뱅크와 손잡았다. 혼자서는 미로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3년을 버텨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시장의 특성에서 나온 필연이다.
일본 소비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면 충성도가 높다. 한국처럼 6개월 만에 떠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 3년을 버틸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투자자 설득이 어렵다. “3년 뒤에 성과가 날 겁니다”라는 말로 투자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빠른 결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공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이 있다.
첫째, 돈을 3배 준비하라. 단순히 운영비만이 아니다. 더 비싼 인재 비용(헤드헌팅 수수료만 35-40%), 더 긴 세일즈 사이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시행착오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3배다.
둘째, 현지 가이드를 확보하라. 한국인을 파견하는 것보다 현지 경험자를 찾는 게 낫다. 일본 기업의 신뢰를 얻으려면 현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인재가 필수다. 비용은 더 들지만 게임의 규칙을 아는 플레이어가 있으면 승률이 높아진다.
셋째, 조직 전체의 각오를 다져라. 투자자든 직원이든 모두가 한국식 속도를 기대하면 결국 모두가 지친다. “최소 3년은 버티겠다”는 전사적 의지가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1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시장, 정부 주도의 DX 정책, 상대적으로 열린 IPO 시장. 무엇보다 성공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지구력의 게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식 “빨리빨리”로는 일본이라는 다른 게임판에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현지 파트너, 그리고 장기적 관점이 있다면 게임의 규칙을 익혀 승리할 수 있다.
매년 200여 개 기업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지만, 0.5%만이 성공한다. 나머지 99.5%가 실패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다른 게임판의 규칙을 미리 익힌다면, 당신은 그 0.5%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 탐방] 오후 5시, 자리는 비었지만 일은 계속되는 회사… 하이퍼커넥트 DSCF6818](https://platum.kr/wp-content/uploads/2025/11/DSCF6818-150x150.jp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