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위험을 감수하며 길을 닦으면, 그 길 위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달려간다. 한국 금융혁신의 현주소다. 수백억 원을 투입해 시장을 검증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제도화 단계에서 밀려나고, 실증에 참여하지 않았던 준공공기관들이 ‘안정된 길’로 진입하고 있다. 혁신의 대가가 기회 박탈이라면, 누가 다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금융혁신은 언제나 검증되지 않은 길을 먼저 걷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수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샌드박스를 통해 제도권이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실험과 혁신을 시도해 왔다. 그중 루센트블록은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국내 최초의 부동산 STO(토큰증권) 플랫폼을 실증했다. 관련 제도나 기준조차 없던 시절, 이들이 맞선 현실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이 실증 과정은 철저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내부 테스트와 외부 검증을 진행했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백억 원의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며 리스크를 감수했지만, 이 실험이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다. 그 믿음은 결과로 입증됐다. 약 3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11개 건물을 상장하며, 5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제도화의 순간, 이야기는 정 반대로 흘러갔다. 실증에 참여하지 않았던 준공공기관들이 어느새인가 경쟁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리스크를 감수한 ‘퍼스트펭귄’은 뒤로 밀리고, 멀찍이 구경하던 ‘공룡’들이 시장의 과실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공적 성향을 띈 기관들의 참여는 의문점을 남긴다. 공적 지위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은 샌드박스의 취지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개척, 수년간 데이터를 쌓고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관련 영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 과정에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장치는 전혀 없다. 심지어 실증 기업이 투자 검토를 이유로 제공한 내부 자료가 나중에는 경쟁기관의 인가 준비 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사실 이미 법은 공로를 인정하고 보호를 명령하고 있다.「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3조는 실증을 통해 사업성을 입증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의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실증이 끝난 뒤에도 인가 경쟁 출발선은 ‘퍼스트 펭귄’이나 ‘먼발치에서 구경하는 공룡’ 모두에게 같았다. 심지어 투자 검토 대상이라고 여겨 실증 기업이 “공룡”과도 같은 기관에 비밀유지 계약까지 체결하고 자료를 넘겼지만, 기업의 중요한 모든 자료를 들여다본 기관이 직접 컨소시엄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실증 기업의 기술과 데이터가 제도화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더 이상 혁신을 위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된다. 스타트업은 실증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샌드박스는 혁신의 인큐베이터가 아닌 ‘무료 실험실’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해외는 다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 싱가포르 통화청(MAS) 등은 실증 기업의 시장 테스트 결과와 기술 역량을 제도화 단계에서 고려 후 인허가 전환 경로나 규제 우대 절차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 실증 완료 기업에게 일정 기간의 우대 심사 또는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며 ‘위험을 감수한 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원칙을 일부 제도화한 사례로 불린다.
이제 대한민국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대형 금융사와 준공공기관들이 결과물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금융혁신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혁신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걸어온 길은 사업의 성공만을 위한 여정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길을 먼저 걸어가야 제도가 진화한다’는 믿음 아래, 대한민국의 금융혁신을 이끌었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스타트업들이 성취해낸 혁신을 보호하지 않고, 거대 기관들의 독점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혁신은 실험에서 나오지만 공정한 제도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 국가가 선택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한 자에게 정당한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혁신의 주인공인 스타트업들을 쓰러트릴 것인가.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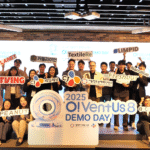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