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왔다. 누구나 쉽게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릴 순 있지만,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 해 특별한 기업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스타트업 현장에서 각 기업 대표들을 만나 취재하면서 창업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곧 ‘나도 한번 창업 해보자’는 생각으로 옮겨갔다. 물론 진짜는 아니다. 가상으로 말이다.

▲나도 과연 창업할 수 있을까?
적게는 20대 초반의 대표부터 40대 중후반까지, 한 기업을 구성하는 대표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쉼 없이 달리고 있다. 때로는 밤낮 가리지 않고 개발을 하기도 하고, 미팅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IR 준비를 하고 말이다. 모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스타트업 현장에서 만난 대표와 팀원들은 모두 그랬다. 그들은 늘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즐거워 보였다. 이들을 보며 때로는 존경심과 경외감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스타트업의 파운더의 자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때였다. 여느 때 같으면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쳤을 하나의 문제점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의 문제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흔히들 ‘기회’라는 것을 나도 발견한 것이다. 폴 그레이엄의 에세이 ‘How to start a startup?’에 보면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것’과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추측하는 것’으로 나눠진다고 쓰여있다. 기자의 경우엔 전자의 경우였다.
▲내게 보이던 시장의 문제, 그리고 두려움
일반적인 예술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졸업할 때 ‘졸업작품’을 만든다. 이들이 만드는 작품은 순수 회화부터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 제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졸업작품에 드는 기간은 짧게는 반년, 길게는 1~2년 정도. 안타까운 점은 이들의 작품은 사나흘의 작품 전시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학교 창고에 쌓여 있다가 버려지곤 한다. 갤러리와 공용공간에 전시 돼있다가 자연스럽게 팔리는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졸업작품은 애초에 거래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의 접점 또한 찾기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와 구매자를 잇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불현듯 떠올랐다. 훌룡한 퀄리티를 자랑하지만, 상당수가 버려지는 작품이 임자를 만난다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도 절감되고, 작품을 만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봤다. 단편적인 사업 아이디어는 그렇게 구상했다.
2017년 1월 기준 국내 예술/디자인 계열은 349개 학과, 이 가운데 학생 수는 평균 1만7천 450명이다. 전국 대학은 사계절 동안 다양한 작품을 내놓는다. 작품엔 가격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를 저렴하게 매입해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공급한다면? 최근 가구와 홈데코에 관심 많은 1인 가구 및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사업 성장성과 응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업 형태로는 그림 렌탈 사업’을 진행중인 ‘오픈갤러리’ 가 있겠다. 이 기업은 국내 유망 작가의 그림(미술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렌탈 또는 판매한다. 동 서비스는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통해 알려졌고 대중들과의 접점 또한 점점 넓혀가는 중이다.
하지만, 비즈니스로 옮겨야 겠다 마음먹은 순간, 두려웠다. 현재 가진 내 능력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
- 회사에 소속해 있음
- 20대 여성
- 개발 할 줄 모름
- 경영학 비전공
게다가 수년 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염두해두고 있기에 쉬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사업은 분명 유의미하게 성장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회사를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사전적 의미의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으로, 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한다. 이런 스타트업의 대표가 된다는 건 분명 멋진 일이지만 위험 부담이 큰 일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조언을 구했다. 대답은 각양각색이었다. ‘사업해라’, ‘사업하지 마라’, 혹은 ‘좋은 아이템이 아니니 다른 사업을 하라’는 등 많은 얘기가 나왔다. 고민이 많았지만, 폴 그레이엄의 에세이에 나온 내용을 보며 사업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스타트업을 해도 무방한 사람들은 ‘23살에서 38살 사이인 개발자, 혹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봉급을 받는 대신 한 방 크게 터뜨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라고 했다.
그가 내린 정의가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는 필수조건 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사업을 고려하는 데 있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초가 되어 줬다.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지금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인생은 길다. 20대 후반이란 나이는 아주 어리지도, 적지도 않아 위아래로 두루 팀원을 구성하기에 적합하다고도 봤다. 게다가 이 사업을 통해 아깝게 버려지는 재능과 창의성을 살린다면 작지만 의미있게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을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사업은 대중과의 소통과도 같다. 그래서 사업성을 확인해보기 위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구상 초기부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계속 다가왔다.
< ②편에서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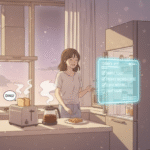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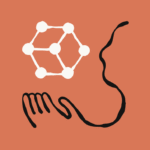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