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잘나가는’ IT 기업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 이곳엔 제2의 애플과 구글을 꿈꾸는 많은 창업자들이 고군분투 중이다. 이들 가운데 성공을 맛본 이들도 있는가 하면, 실패한 기업도 있다.
28일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행사에서는 윤정섭 미띵스(Methinks) 대표가 2013년 실리콘밸리에 처음 입성한 때부터 2015년 사업 실패를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을 청중과 공유했다. 미띵스는 영어권 국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다자 인터뷰 및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윤 대표는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 하며 “80%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창업에 실패하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때의 실패가 경험이 되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푼 꿈을 안고 간 실리콘밸리, 사업에 필요한 팀, 제품, 시장은 갖춰져 있었다.
부푼 꿈을 안고 간 실리콘밸리, 사업에 필요한 팀, 제품, 시장은 갖춰져 있었다.
2013년의 일이다.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면 팀, 프로덕트, 마켓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자마자 최고의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코파운더를 찾는데만 여섯 달을 소모했다. 이 과정에서 운 좋게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 MIT 박사 학력에 구글 출신, 그리고 만들려던 제품 또한 비슷했다. 그이후 인재 영입은 순조로웠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징가, 구글 등 유명 테크기업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속속 합류했다.
5억원의 초기 자금, 드림팀, 구글의 지원…그러나 처참한 리텐션.
공동창업자와 함께 모은 초기 자본금이 5억원이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팀은 일정 규모의 펀딩이 확보된 상황에서 코딩, 디자인 등 기본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이들과 여섯 달동안 ‘가족과 친구를 위한 소셜게임’을 만들어 2014년 1월 론칭했다. 구글이 69개국에 피쳐해 주는 등 출발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재사용 비율이 엉망이었다.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안됐다. 결국 넉 달이 지나 ‘실패’를 선언했다.
남은 돈은 1억원, 거듭되는 갈등으로 팀원을 잃다.
첫 제품이 실패로 끝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자금이 부족했기에 펀딩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제품이 가진 문제를 다시 파악했다. 수정을 거듭해 첫 제품에서 필요없다 생각한 부분을 지웠다. 그 과정에서 팀원 간 의견 충돌이 계속 되어 핵심 인력을 잃었다.
시장을, 고객 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펀딩 피칭을 하러 다닐 때, 우리 제품을 사용해 줄 고객(시장)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초기에 우리가 타깃으로 했던 고객은 도시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 고객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었고 그림만 그려놓고 일을 했었다.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뤄둔 거다. 사실 이 고민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 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론칭한지 5달 뒤에서야 깊이 생각을 했던 거다. 당연히 리더십에 위기가 찾아왔다. 어떤 시장과 타겟에게 제품을 팔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데, 그게 부족했다. 2014년 10월, 다시한번 실패를 경험했다.
끝의 시작
초기 자금 5억을 거의 다 쓰고, 잔고는 300만원, 회사엔 2명만 남았다. 더이상 펀딩도 사람도 끌어올 상황이 아니었기에 둘이서 모든 걸 다 하기로 했다. 코딩, 디자인, 운영 등 2년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가며 제품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소셜 게임을 2015년 1월에 베타버젼으로 론칭했다. 운좋게 그 즈음 엔젤투자도 받아 마케팅도 할 수 있게 됐다. 없는 상황에서도 되긴 되는구나 싶었다.
정확한 타겟 조사를 꼭 하라.
실리콘밸리는 생각만큼 화려하지 않다. 고객을 만나기도 힘들다.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도 많이 든다. 이곳에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겟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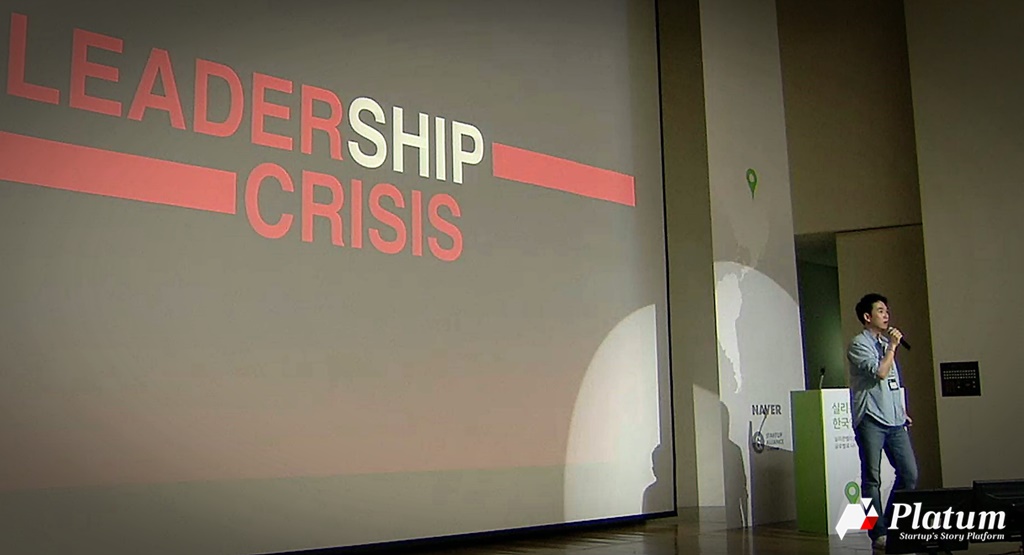


![[스타트업 탐방] 오후 5시, 자리는 비었지만 일은 계속되는 회사… 하이퍼커넥트 DSCF6818](https://platum.kr/wp-content/uploads/2025/11/DSCF6818-150x150.jpg)
![[BLT칼럼] 엔젤투자의 3가지 즐거움 1114b3aee2b12](https://platum.kr/wp-content/uploads/2025/11/1114b3aee2b12-150x150.png)
![[중국 비즈니스 트렌드&동향] 스타벅스 중국 사업 지분 60% 매각 20230510_133701](https://platum.kr/wp-content/uploads/2025/11/20230510_133701-150x150.jp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