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호들 중 재산을 자선 사업에 쓰는 이들이 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이 그 부류다. 그렇다면 자선 사업은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이라고 칭하는 스타트업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비전과 미션을 지속할 수 있을까.
28일 열린 스파크랩 데모데이 행사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피치 세션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제시카 재클리, 존 J.우드가 테크 전문 기자인 일레인 라미레즈의 진행 아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혁신을 통한 빈곤 퇴치’라는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제시카 재클리는 빈곤 퇴치를 위한 P2P 마이크로렌딩 서비스 ‘키바’ 공동 창업자이며, 존 J.우드는 비영리 단체 룸투리드(Room to read)의 창업자다.

왼쪽부터 제시카 재클리, 존 J.우드, 모더레이터:일레인 라미레즈 /사진=플래텀 DB
존엄성을 잃은 이들에게 자본으로 다시 일으켜 자존감과 의지를 되찾아 주다, ‘키바’
재클리: 대학에선 경영,경제과 거리가 먼 시와 철학을 전공한 인문학도였다. 필요성을 느껴 경영대학원에 진학했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대학원에서 만난 이들은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닌 자신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들은 사회 기여와 사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후 아프리카에서 삶의 의지가 사라진 극빈곤 계층 사람들을 보며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상기시키고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선 사업이 아닌 삶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소액대출 서비스 ‘키바’를 만들었고, 이 일을 한지 12년 됐다. 현재는 정말 많은 소액대출이 이뤄지고 있고 상환률도 높다.
교육 기회가 적은 제3세계 국가에 마을 도서관을 짓는다, ‘룸트리드’
우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9년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다. 일에 회의감이 느껴질 때쯤 네팔에 갔다. 400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방문했는데, 모두 가난한 친구들이었다. 부모의 문맹률도 높았고 무엇보다 학교에 책이 없었다. 전세계의 80%가 빈곤국 국민이다. 게다가 8명 중 1명 꼴로 문맹이다. 세계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평등하게 주는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룸트리드를 시작하게 됐다.
룸트리는 전세계 열악한 교육현장을 누비고 있다. 캄보디아엔 학교를 세웠고, 베트남엔 도서관을 지었다. 지금껏 세운 학교는 전세계 총 2천 개교, 우리가 구입해 나눠준 책은 200만 권이 넘는다. 올해 안으론 도서관 2만 군데를 더 짓는 게 목표다.
사회적 기업은 자선 사업도, 기업이라고도 단정지을 수 없는 새로운 개념
우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일을 한다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기업 활동에 사회적 역량을 더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면 그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클리: 내게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 지어 이를 합치니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태어났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곳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는 것이 고민이라면
재클리: 이 분야에 관심은 많았지만, 처음에는 키바가 부업이었다. 하다 보니 많은 수요가 있겠다 판단했고, 잠재력이 있음을 알게 된 뒤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사회적기업에 당장 뛰어드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단기 프로젝트 형식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내 경우엔 일을 해본 뒤 풀타임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시작했다. 이 일이 최우선 과제였을 때다.
우드: 동의한다. 누구나 이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일을 하면서 참여하면 부담감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누굴 돕고 싶은지 생각하라, 그리고 어떤 사회적 파장이 미칠 지 인지하라.
우드: 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누구를 돕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열정적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리더에겐 열정이 요구된다. 역동적인 에너지 없이 사업을 하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재클리: 어느정도 조건이 갖춰지고 나면 일단 시도해야 한다. 시도한 이후엔 전략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할 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영리/비영리 기업 모두 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라”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관점
우드: 사회적 책임을 꼭 생각해야 한다. 룸트리드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일로 느껴져서 뛰어들었다. 이익을 창출하며 세상에 공헌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 배운 게 있다. 바로 과감한 결정이다. 우린 2020년까지 천만 명에게 학교를 제공한다는 목표가 있다. 무모하다고 생각할 거다. 허나 성공할거라 믿고있다.
재클리: 우리의 투자자 중 한 명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영리만을 좇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멀리 보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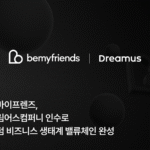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