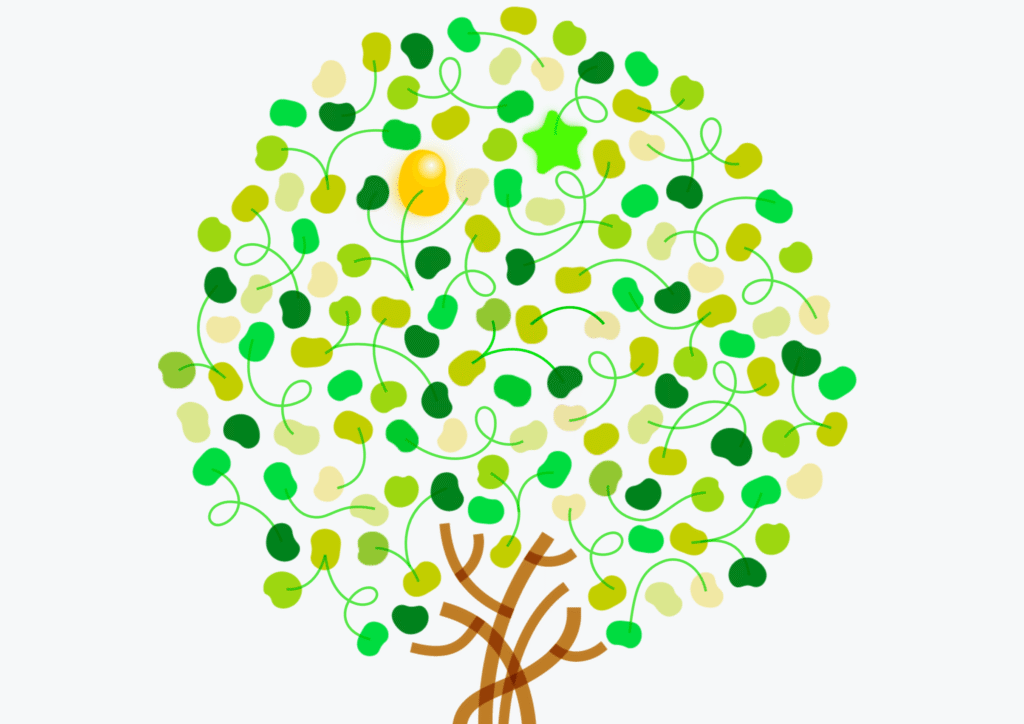
천원짜리 지폐의 힘에 대하여
혹은 이십 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에 관한 기록
우리는 종종 기적이 어떤 거대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착각한다. 천지를 가르는 번개처럼, 산을 무너뜨리는 태풍처럼 말이다. 하지만 때로는 기적이 천원짜리 지폐 한 장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걸, 2005년 7월 어느 평범한 여름날 이후로 우리는 배우게 되었다.
네이버 해피빈이라는 이름의 작은 플랫폼이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그것이 이십 년 후 삼천억 원이라는 숫자로 기록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이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꺼낸 작은 선의가 모여 만들어낸 숫자였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난다. 한 사람당 평균 기부금액은 4,300원, 평균 기부 횟수는 5.17회. 대체 누가 이런 수치를 만들어낼 생각을 했을까. 한 번에 큰 돈을 내는 대신, 작은 돈을 여러 번 내는 이 기묘한 패턴 말이다.
이것을 ‘나노기부’라고 부르더라. 나노미터처럼 작다는 뜻이겠지만, 정작 그 작은 것들이 모였을 때의 힘은 거대했다. 어떤 한 사람은 이십 년 동안 53,900번이나 기부했다고 한다. 거의 매일 한 번씩, 아니 하루에 일곱 번씩 기부한 셈이다. 그 사람의 하루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2014년 3월, 해피빈이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결제 기부자가 연평균 564% 증가했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침대에 누워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2015년 6월에는 네이버페이 간편결제가 추가되었다. 복잡한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도 없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해부터 기부금이 19%, 이듬해에는 26% 증가했다. 편리함이 선의를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네이버에는 ‘콩’이라는 기묘한 화폐가 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식인에서 누군가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면 받을 수 있는 가상의 돈. 한 알에 백 원의 가치를 지닌 이 콩들이 지금까지 436억 원어치나 기부되었다.
생각해보면 묘한 일이다. 누군가 궁금해하는 것에 답을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콩을 다시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일. 지식의 순환이 선의의 순환으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분명 시인의 마음을 가진 엔지니어였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고들 한다. 해피빈을 통해 본 한국인들의 본성은 놀라웠다. 2020년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 2022년 삼척에 산불이 났을 때, 2023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올해 경상도와 울산에 다시 산불이 났을 때. 매번 해피빈을 통한 기부는 평소보다 훨씬 빨라졌다.
6년 동안 재해재난만으로 모인 기부금이 418억 원. 이 숫자 뒤에는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숨어 있다. 직접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들.
‘한빛사랑후원회’라는 단체가 있다. 백혈병과 소아암 환아들을 돌보는 쉼터를 운영한다. 2014년부터 해피빈에서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한다. 목포에는 ‘목포우리집’이라는 아동보호시설이 있다. 명절, 방학, 크리스마스 등 기부금이 특히 많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모금함을 개설하고 모금 후기를 전하며 이용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이런 작은 단체들에게 해피빈은 단순한 모금 플랫폼이 아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무대이다. 대기업의 화려한 광고비 없이도, 진심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
2005년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시작된 해피빈은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2009년 재단을 설립하고, 2015년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했다. 2017년에는 ‘공감가게’를 만들어 소셜벤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19년의 ‘가볼까’ 서비스는 기부를 넘어 체험으로 확장되었다. 착한 가게를 소개하고, 공익적인 체험을 연결하는. 2024년에는 ‘기부키오스크’라는 것까지 만들었다. 사옥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더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키오스크. 선의도 이제 기술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 20년간 해피빈을 통해 네이버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익단체, 기업, 소상공인, 창작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나눔 덕분에 국내 온라인 기부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해피빈의 이일구 대표는 말했다.
성숙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든다. 기부 문화가 성숙했다는 것.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습관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는 “인터넷 시대부터 모바일 진화와 AI 파고까지 디지털 환경 발전에 맞춰 기부의 형식과 참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고 했다. AI 시대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부의 방식이 등장할까. 생각만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
때로는 큰 변화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천원짜리 지폐 한 장, 스마트폰 터치 몇 번, 블로그 글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십 년 만에 삼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되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천이백만 개의 마음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해피빈을 열고 있을 것이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몇 천 원짜리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2005년 7월 10일, 해피빈이 문을 열었다. 2025년 7월 10일, 우리는 그 이십 년의 기록을 정리해본다. 숫자로는 3,000억 원, 1,200만 명, 15만 개의 모금함.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 속 작은 선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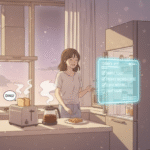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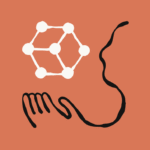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