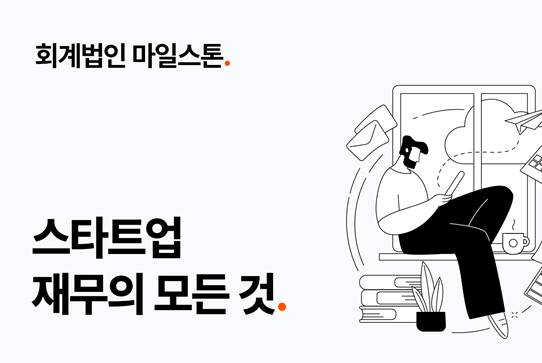
- CPS와 RCPS란?
CPS는 “전환우선주”, RCPS는 “상환전환우선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CPS와 RCPS가 단순 지분투자에 비해 상환권·전환권이라는 추가 옵션을 제공하므로, 더 높은 투자 유인이 존재합니다.
- CPS와 RCPS의 차이?
CPS와 RCPS의 가장 큰 차이는 “R(Redemption)”로, 상환권의 유무입니다. CPS는 전환권만, 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가진 구조입니다.
상환권은 상황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액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회사(발행자) 입장에서는 언젠가 갚아야 할 채무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할 회계처리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 회계처리 차이
대한민국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크게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나뉩니다. 단순화하면 K-GAAP은 비교적 느슨한 기준, K-IFRS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K-GAAP에서 RCPS와 CPS는 모두 우선주로 간주하여, 상환권·전환권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받은 금액 전액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반면 K-IFRS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RCPS와 CPS 모두에 대해 별도의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자본비율 악화 가능).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IFRS 기준 자본과 부채 인식
1) RCPS
RCPS는 주계약(지분투자)과 내재파생상품(전환권·상환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분된 내재파생상품 중 회사(발행자) 입장에서 주계약과 별도의 계약상 의무로 판단되는 요소는 별도로 구분해야 하며, 상환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환권이라는 내재파생상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액만큼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환권이 회사(발행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 드문 사례입니다.
2) CPS – Refixing 조항 고려
CPS는 주계약(지분투자)과 내재파생상품(전환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분된 내재파생상품 중 회사(발행자) 입장에서 주계약과 별도의 계약상 의무로 판단되는 요소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전환권의 경우, ‘Refixing 조항’이라는 핵심 요소에 따라 별도 구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Refixing 조항
Refixing 조항이란 일정 상황에 따라 주식 전환 행사가와 수량 등을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단순히 투자자의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예: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발생 시 지분율 감소분만큼 전환가액 조정)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 희석효과 방지와 무관한 조항(예: IPO,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서 산정된 주식가액의 70%로 조정 등)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발행자) 입장에서 별도의 계약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전환권임에도 불구하고, 내재파생상품으로서 별도의 계약상 의무와 부채로 인식됩니다.
- 결론
위 내용이 단순 회계처리로 끝난다면 간단하겠지만, 자본 외에 별도의 부채를 인식해야 할 경우 매년 부채금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채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상황에 따른 정확한 회계처리와 적절한 투자계획을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와 사전에 논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