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창업자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나 잘 실패하고, 잘 극복해 정상궤도에 오르는 창업자는 많지 않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은 애쓰는 연습생이 아니라, 돈을 벌 줄 아는 능수능란한 창업가를 찾고 있다.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 살벌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시행착오를 넘어 노련한 사업가로 성장한 대표들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극복했을까. 또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비전을 따를 수 있게 만드는 이들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지난 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비공개로 개최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Korea Startup Forum)’에 참석한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봤다.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극복했나]
“돈이 벌리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건 완전 다르더라” –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
수제 가구 사업을 하다 망했다. 내 눈엔 참 예뻤고, 그 사업을 좋아했다. 웹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가게를 운영했으니까. 여성지에서 와서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협찬도 많이 했다. 하지만 돈이 벌리진 않았다. 그땐 덩치 큰 가구를 팔면서도 부동산 임대료와 같은 사업 유지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대치동 주민들이 돈을 많이 쓸 것이라는 건 착각이었다. 그리고 가구를 판매할 때 30~40% 할인이 기본을 들어간다. 이윤이 20~30%밖에 안 되는데, 팔아도 손해고 가지고 있어도 손해인 거다. 그때 처음 ‘돈이 벌리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당시에 마 끈에 나무 집게를 꼽아 사진을 걸어놓는 가렌다를 내가 처음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고, 매장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 마진율이 80%였다. 가렌다는 팔면 무조건 남는 장사였는데, 괜히 자존심 상하고 싫더라. 나중엔 그게 얼굴에 드러났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 나무 집게 제품을 고도화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가구 장사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다. 그런 사례들이 늘 많다. 살아남은 게 신기하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고집을 부렸다” – 스포카 최재승 대표
2011년도에 쿠폰 서비스 앱을 만들었다가 실패했다. 당시 200~300개 매장에 설치했는데 하루 사용자 수(DAU)가 20명이었다. 20명 가지고 그로스 해킹을 할 수도 없고, 처참했다.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돈 떨어질 때까지 계속했다. 엔젤 투자 비용이 바닥날 때 즈음에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 후 2주 간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든 게 지금의 스포카다. 서비스 첫 개시일에 이전 대비 14배의 사용자 수가 나오자마자, 나머지 투자금으로 태블릿 200개를 만들어서 홍대 지역 매장에 설치했다. 그게 고생의 시작이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훨씬 똑똑하게 피봇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사실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내가 만든 서비스에 대한 애착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본질에 어긋나는 쓸데없는 기능도 넣다가 2, 3개월을 낭비했다. 이전엔 자아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주주 간 계약서 때문에 망한 회사도 있다” – 온오프믹스 양준철 대표
공동 창업자 간 주주 간 계약서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다가 낭패 보는 스타트업이 많다. 한 기업은 공동 창업자 3명이 지분을 나눴는데, 대표가 가장 적게 가져갔다. 근데 나중에 대표를 제외한 2명이 사적인 이유로 회사를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근데 주주 간 계약서 안에 의무종사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갔을 때에 대한 패널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대표가 사비로 주식을 다 되찾아왔어야 했는데, 꽤 높은 가치로 투자를 받은 이후여서 쉽지가 않았다.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후기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의사 결정권이 밖에 나가 있는 상태니까, VC 입장에서 뭘 보고 투자 하겠나. 결국 그 회사는 망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주주 간 계약서를 대충 쓰거나, 아예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선 안 된다.
“투자자에 대한 평판 확인 문화가 필요하다”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국내에서는 투자 얘기가 오갈 때, 창업자가 다른 출처를 통해 조언을 듣고 평판을 확인하는 것을 싫어하는 투자자들도 더러 있더라. 하지만 투자자-창업자 간의 서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투자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좋은 투자 관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서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 투자가 어그러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적은 규모로 엔젤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창업자 간 평판 확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창업자를 옭아매는 악의적인 투자 계약을 한 투자자의 경우, 커뮤니티 안에서 빠르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다음에 좋은 딜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국내에서도 평판 기반의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대기업 인맥, 실제 나와 보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 착한텔레콤 박종일 대표
KT 통신사에서 7년을 일했고, 대우증권에서 2년 반 동안 핀테크 관련 업무를 했다. 총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한 셈이다. 대기업에서 꽤 많은 인맥을 쌓았지만, 결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처음에는 다들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와보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결국 그들에게 나 역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명확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내가 이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과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대기업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과정에서 내 이용 가치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내 경우에도 이전 회사에서 통신 요금을 계획했던 경험과, 과거 알티폰 사업할 때 만들었던 인맥이 나중엔 큰 도움이 됐다.
[직원들이 같은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 야놀자 이수진 대표
사업을 시작한 지는 만 12년이 넘었고, 사람이 꽤 많아졌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첫 투자를 받은 건 2년이 채 안됐다.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조직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변화의 과정에 있다. 직원 각 개인에게 하나의 비전을 심어주기는 어렵다. 다만 옛날부터 조직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다. ‘현재 하는 일이, 본인의 일로서 남을 수 있게끔 시간을 보내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만을 위해 일하지는 말라고 늘 당부한다.
대표들은 욕심이 많다. ‘왜 저 직원은 나만큼 일을 안 할까, 나만큼 돈을 아끼지 않을까’하고 불만을 갖기도 한다.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사람이고. 구성원마다 다양성이 있고, 그들 개인의 이익과 삶이 있는 법이다. 우리 기업에 있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삶을 타이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는 게 중요하다. 어느 회사를 가든지, 최선의 노력을 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말이다.
“‘왜?’에 대해 오래 설명할수록 실행 속도는 빨라진다” – 플러스 김태호 대표
플러스는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비용과 인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초기 멤버가 20명 정도로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땐 여러 사람을 거쳐야하므로 힘이 들었다. 과거 우리 회사에서 ‘탑다운(Top Down)’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였다. 탑다운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지를 추적해봤는데, ‘왜’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경영진 몇 명만 모여 결정을 짠하고 내리면, 팀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경우 각 구성원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해야 효율이 난다. 즉 ‘왜’에 대한 설명을 오래할수록, 실행 속도는 빨라진다. 이 과정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자기가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플러스에서는 세부 내용을 하나씩 다 설명하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시키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일의 방향이 눈에 보이면, 모두가 같은 목표를 세운다” – 온오프믹스 양준철 대표
2010년 법인을 설립해 횟수로 치면 8년 차 기업이 됐는데, 지금까지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네 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사장-부사장 체계에서, 공동 창업자 체계로, 또 팀장 체계에서 지금은 전 직원이 일정 수준의 의결권을 갖는 체계로 바뀌었다. 온오프믹스에서는 전 직원이 하는 업무를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슈 트래커인 지라(Jira)를 활용하고 있는데, 작은 사무 비품의 구매 과정까지도 다 공유되면서 모두가 진행 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남길 수 있다. 현재 시점에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전 직원이 알고 있으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2015년부터 실험해보고 있는 것이, 연간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거다. 대표인 내가 아무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팀원들에게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의 전권을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다. 놀랍게도, 나의 생각과 100% 일치하는 사업 계획서가 나왔다. 회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지식 관리 시스템에 가시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표가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모두의 비전과 생각이 일치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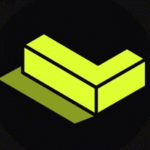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