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7월 한 달 간 플래텀에는 능력있는 인턴이 한 분 근무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의 김보경 인턴입니다. 김인턴이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이 겪었던 플래텀에서의 한 달을 정리해 주셨네요. 기자를 꿈꾸는 김인턴의 꿈을 응원합니다.

6월 27일, 플래텀과의 첫 만남
면접 겸 OT 자리라 긴장을 꽤 많이 했다. 손요한 편집장과 구슬 매니저가 박수지 인턴과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딱딱한 면접 자리라기 보단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나 희망 진로, 한 달 간 플래텀에서 맡게 될 직무에 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다.
하지만 플래텀이 ‘스타트업 미디어’ 라는 것 외에는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 투자 관련 용어 중 알아 듣는 게 별로 없었다.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한 동시에 내가 원하던 미디어 회사에서 일해 볼 수 있다는 설렘을 느끼며 돌아갔다.
7월 1일, 인턴 기자로서의 첫 날
인턴 기간 동안 사수와 부사수로 함께 하게 된 이가은 기자와 커피를 한 잔 함께하며 알아두면 좋을 업계 용어와 참고할만한 기사들을 소개해 주었다. 특히 ‘가은아 떠나지마’ 시리즈 중 이가은 기자의 플래텀 입사기는 무척 인상 깊게 읽었다. 직업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왔던 나는 그 글을 읽고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스스로 무언가를 완성해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 처음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출근 첫 날부터 인터뷰 일정이 있었다. 인터뷰이는 블룸앤보울과 데어즈의 창업가 부부였다. 이가은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했고, 나는 옆에서 사진 촬영 및 인터뷰 보조를 맡았다. 보조 인터뷰어로서 인터뷰에 참여하니 한 CEO의 인생에 대한 강연을 일대일로 듣는 기분이었다.
한달 동안의 인턴생활에서 내 주업무는 녹취본 정리와 편집이었다. 인터뷰 녹취본을 다시 들으며 글로 쓰는 작업은 단순한 받아쓰기가 아니었다. 전문 용어를 포함한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알아듣고 빠르게 적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말에 담긴 인터뷰이의 숨은 의도까지 간파해내야 했다. 그리고 녹음 내용을 그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수없이 고치고 버리고 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때로는 완곡하게 표현해야 하기도 했고. 꽤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었지만 첫 날이라 그런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게 재미있게 일했다. 여태껏 아르바이트나 학교 수업만 듣던 내가 처음으로 일 다운 일을 해 본 하루였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린 한 달,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 일정이 거의 매일 잡혀 있었다.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터뷰의 인터뷰이는 키마, 데어즈, 사이러스, OEC, 쿠팡, 29CM, 배달의민족, 파이브락스, 엠쿠키, 네오펙트, D.CAMP, 드림엔터, 아이디어보브, 리얼씨리얼 등으로, 한 달 간 나는 총 열 네 개의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자들을 만났다. 모두가 의미 있는 설립 취지를 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기업과 단체들이었다.
그저 학생이었다면 한 회사의 대표를 직접 만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거다. 인터뷰어로서 그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새삼 영광이라는 소견이다. 더불어 인터뷰 보조 업무를 했을 뿐인데, 플래텀 인턴 기자로서 여러 기사를 직접 발행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다.
기사 작성법에 대해 배워본 적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본 적도 없었기에 글의 질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전부터 글을 쓰는 것이 재미있었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기자로 일한다는 것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만 두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인터뷰이의 요청에 응대하고 매체방향에 부합하는 기업인지 자료 조사를 통해 판단하고, 사전에 질의안을 구상하고, 계속해서 인터뷰이와 컨택하고 조율해서 인터뷰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인터뷰이가 강조하는 내용, 독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대답에 반응하고 피드백하고 듣고 또 들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낸 이후에야 비로소 글을 쓰고 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전부가 한 건의 인터뷰 기사를 발행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게다가 인터뷰 외에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작성해야 함은 물론 SNS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또다른 일이었다.
또한 인터뷰이의 깊이있는 창업 스토리에 대해 듣고 나면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관점을 알게 되고, 특정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고나 할까? 한 달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결코 얕지 않았다.
특히 플래텀에서의 한 달은 기자는 마냥 글만을 쓰는 직업이라 여겼던 개인적 편견을 깬 기간이기도 했다.

조금은 솔직한 이야기, 나에게 플래텀이란?
플래텀 인턴은 솔직히 방학 동안 학점을 따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되었다. 처음 플래텀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조차 감이 오지 않았다. 스타트업 미디어라는 것만 듣고 왔는데 사실 스타트업이란 용어자체도 생소했다. 물론 그러한 낯설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 달 인턴 기자 생활을 한 현재 내가 특별히 달라졌다거나 크게 대오각성한 부분 역시 없다. 하지만 분명히 얻은 것이 있다.
우선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여느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과 다를 바 없이 나 역시 연봉과 복지가 보장되는 대기업을 선호했었다. 그런데 한 달 간 스타트업 CEO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플래텀 이가은 기자와 구슬 매니저가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연봉과 주변 시선에 얽매여 대기업에만 목 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열정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세상에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고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아직 불분명하긴 하지만 꿈을 좇아 나도 이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정말 좋은 식구들을 만나 즐겁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다. 내게 플래텀은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다시 일하러 가고 싶은 곳이다. 그리고 기자가 책상앞에서 글만 쓰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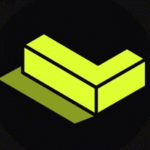





Leave a Comment